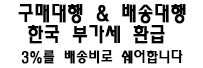| 연재칼럼 | 지난칼럼 |

그 집 앞
그 집은 강둑 아래 있다. 강 맞은편 들녘에 외따로 서있다. 강둑은 내가 자주 걷는 길이라 대문을 나서면 발길이 곧장 그리로 향한다. 둑 어귀에서 눈에 들어와, 걷는 내내 길동무가 되어주는 그 집이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저것도 집인가 했었다. 잡목 사이로 드러난 지붕은 사람이 살만 한 꼴이 아니었다. 집 모양을 제대로 갖춘 것이 2년쯤 되었나. 그사이 집은 꽃과 나무가 자라는 뜰과 작물이 커가는 텃밭을 거느린 번듯한 농가가 되었다. 철따라 변하는 농장과 고요한 강을 끼고 훤하게 뚫린 길. 외딴집이 보이는 그 둑길을 걸을 때면 시골로 내려와 사는 일이 더없이 푸근해진다. 그 집에는 부지런한 남자가 혼자 살고 있다.
그는 키다리아저씨다. 너무 여위어서 더 길어 보이는 주인은 수건 위에 모자를 눌러쓰고 사철 허리 굽혀 일한다. 눈에 띌 때마다 밭고랑에 엎드려 있는 남자에게 미안하여 나는 집이 가까워오면 일부러 강을 보는 척 외면하고 걷는다. 들깨를 털 때던가. 딱 한번 부인인 듯한 여자가 일 거드는 모습을 보고 안심이 되었는데 그 뒤로는 또 외톨이다. 시내에 살고 있다는 가족은 무얼 하는지. 혼잣손으로 메마른 땅을 옥토로 바꾸어 놓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휘청휘청 일하는 모습이 딱하게만 보인다.
자연이 맨몸으로 드러나는 계절. 늘 자리를 지키던 차도 보이지 않는 날이다. 이런 날은 마음 놓고 집을 내려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초목이 한창일 때는 보이지 않던 마당에 가지치기로 멀끔하게 단장한 나무들이 겨울잠에 빠져있다. 큰 나무 밑은 공원에나 있음직한 긴 식탁과 바비큐 시설이 자리 잡았고 넓은 처마 그늘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시래기타래. 섬세한 손길이 스민 뜰이다. 혼자 사는 집에 저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람. 나는 빈집을 바라보며 쓸데없는 참견을 하다가는 관심을 들킨 듯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벗어난다.
그 집을 보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다.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현제명 곡의 그 노래가 간절하던 때가 있었다. 대학 2학년 학기가 시작된 날이었다. 복학생이라며 인사하는 남학생들 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다. 늙수그레하지만 준수한 외모에 시를 쓴다는 것이 마음을 끌었는지 친구들은 어울리면 그 사람 얘기를 했다. 듣기만 하던 나는 용기를 내어 친구가 알아낸 번지수를 들고 길을 나섰다. 나른한 여름날 오후, 다리가 퉁퉁 붓도록 장충동을 누비며 마음으로 부르던 노래가‘그 집 앞’이었다.
그것은 그리움의 노래다. 그 노래를 들으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 오래전에 그리워했던 이와 지금 그리운 사람. 그들은 내 삶을 삭막하지 않게 다독이는 고마운 이들이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아닐까. 외로울 때 짬짬이 생각나는 사람. 풀죽은 마음에 용기를 북돋우는 사람. 가곡 그 집 앞을 나직이 불러본다.‘오히려 눈에 띌까 다시 걸어도/ 되 오면 그 자리에 서졌습니다.’그 소절을 부를 때면 그리운 이가 살던 집이 눈에 잡힐 듯 떠오르고 내 마음을 닮은 노랫말에 감탄하게 된다.
나는 날마다 강둑 아래 그 집 앞을 지난다. 그런데도 주인이 키가 크다는 것 밖에는 아는 것이 없다. 모르는 사람의 집이니 노래 속의 그 집은 아니다. 하지만 상관없다. 한참을 걸어도 사람의 집을 만날 수 없는 길에서는 사람 기척만으로도 친한 사람을 대한 듯 정다우니까. 내가 걷는 길에 아담한 집 한 채 있음이 감사하다. 내 것이 아니어도 내 것인 양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집. 주인의 손길로 생기를 더하는 그 집을 지날 때면 나도 몰래 발걸음이 리듬을 탄다.
입춘이라 봄을 마중 나왔다. 차가운 날씨에도 눈 익은 차는 제자리에 서있고 주인은 밭둑에서 검불을 모으느라 분주하다. 눈길을 강으로 돌려도 반가운 마음까지 돌릴 수는 없는 일. 내 그리움 속에는 저 외딴집도 벌써‘그 집’으로 들어와 있었나 보다.
■ 최 현숙
























































































































































![유트브: [뉴질랜드 사는 김유나] 채널 운영
사진여행, 트래킹여행, 캠퍼밴 동호회 진행
캠퍼밴 렌트대행, 여행상담
캠퍼밴트래블(주) 캠트여행사 대표](/img/columnlist/photo_202101121055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