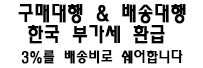| 연재칼럼 | 지난칼럼 |

[305] 추억의 손수건
0 개
2,709
28/09/2005. 15:59
코리아타임즈
자유기고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꼭 건강하셔야 해요.”
보통 때와 다르게 은근하고 진지한 목소리가 갈증나게 내 귀를 간지럽힌다.
“지금 어디시여?”
늘상 알면서도 물어 보는 내 어리석음은 치매증처럼 여전하다.
“엄마는 어디긴 여기에 왔지”
설 하루 전 섣달그믐날에 받는 딸아이의 전화는 언제나 그렇게 시작되고 간단히 끝이 난다. 내일(설날)은 더 바쁠테니까 주방에서 일하다가 잠깐 틈을 봐서 전화를 한다는 그 애의 말. 시댁 식구들 안 보이게 어느 한 귀퉁이에 쪼그려 앉아 핸드폰을 들고 통화하는 모습이 눈에 본 듯 선하다.
아무리 아들 딸 구별않고 사는 세상이라지만 명절때만 되면 시댁으로 가야하는 딸들을 보내놓고 한없이 공허한 마음이 되어야하는 아들없는 친정엄마. 남의 아들 열하고도 안 바꾼다고 정성으로 키운 딸자식들인데 모두가 제 갈 곳으로 떠나 보내고 나니 이제 나는 한 그루의 헐벗은 나목이 되어 외로이 서있는 꼴이다. 이런게 인생임을 절감하면서…, 이럴 때마다 나는 버릇처럼 서랍으로 손이 간다. 눈길 닿을 때마다 짜릿한 흥분으로 마음을 흔들어 놓는 곱게 접은 낡은 손수건, 그 손수건에 담긴 추억을 더듬으며 애들과 함께 했던 세월들을 반추해 본다.
하얀 아사천에 아무렇게나 떨군 것같은 붉고 푸른 물감칠이 꽃인양 사이 사이에 작은 잎새들이 몇 개있다. 자그마치 이십여년이나 나이를 먹고 땀에 삭고 낡아서 찢어질 듯 얇아진 것이지만 나는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
누구나 긴 인생을 살다 보면 견디기 어려운 시련의 세월이 있기 마련인가보다. 내게도 한 때 그런 때가 있어 허망한 나날들을 절망하고 살 때였다. 새장에 갇힌 새처럼 집안에만 갇혀 갈등하다가 찾아 낸 돌파구가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였다. 현실 도피하듯 괴로운 시간들을 달래보자는 생각일 뿐 자격이나 되는 사람인지도 깊이 생각 못했다.
아직은 어린 꿈나무들이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상처 속에서 고통을 호소 해 오는 것을 보고 들으며 삶은 곧 고통이고 그 고통 속에서 성숙해져 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프면서 크는 나무가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듯이 그들과 함께 교감하면서 내 자신이 더 큰 위로를 받고 있음도 알게 되었다. 내 고통 때문에 사랑하는 내 자식들 여린가슴 다치게 할까봐 조심도 하고 그들 나름의 세대를 이해하는 좋은 친구가 되어 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나. 10년 긴 세월, 금요일을 내놓은 1000 시간이 넘는 동안에 나는 빛나는 새 세상에 다시 태어난 듯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 드리며 사는 가슴 넓은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엄마 더위에 고생 많으시죠. 여기 이 손수건으로 땀 닦으시고 보람의 나날 되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작은 아이가 등교한 다음에 내 베개 밑에서 편지 한 통과 얌전히 접은 손수건 두 장을 발견했다. 내가 잘못 살지 않았음을 인정받은 것같아 눈물겹게 감동했던 짜릿한 그 때 기분을 어찌 잊으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내 삶이고 희망이고 전부이잖은가.
어려울 때 엄마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친구가 되어주던 내 사랑하는 딸들. 빳빳하게 날이 선 새하얀 컬러의 교복을 입고 등교하던 그 애가 벌써 사십 나이에 와 있다. 이젠 내가 응석을 부리는 입장이 되어서 그들이 날 다독이고 달래 준다.
세파가 할퀴고 지나간 상처를 아물게 해 준 소녀시절의 그 따뜻한 딸의 마음 두고두고 못잊어 영원히 내 가슴속에 묻어 두고 보는 추억의 낡은 손수건. 일찌기 나와 함께 삶의 고통을 나누었던 청소년들도 이젠 으젓한 가장이 되어 훌륭하게 살고 있겠지. 태풍이 지나간 후에 바다는 더더욱 잔잔해 지는 것처럼…….
그 손수건 속엔 그들의 얼굴도 함께 그려져 있다.
보통 때와 다르게 은근하고 진지한 목소리가 갈증나게 내 귀를 간지럽힌다.
“지금 어디시여?”
늘상 알면서도 물어 보는 내 어리석음은 치매증처럼 여전하다.
“엄마는 어디긴 여기에 왔지”
설 하루 전 섣달그믐날에 받는 딸아이의 전화는 언제나 그렇게 시작되고 간단히 끝이 난다. 내일(설날)은 더 바쁠테니까 주방에서 일하다가 잠깐 틈을 봐서 전화를 한다는 그 애의 말. 시댁 식구들 안 보이게 어느 한 귀퉁이에 쪼그려 앉아 핸드폰을 들고 통화하는 모습이 눈에 본 듯 선하다.
아무리 아들 딸 구별않고 사는 세상이라지만 명절때만 되면 시댁으로 가야하는 딸들을 보내놓고 한없이 공허한 마음이 되어야하는 아들없는 친정엄마. 남의 아들 열하고도 안 바꾼다고 정성으로 키운 딸자식들인데 모두가 제 갈 곳으로 떠나 보내고 나니 이제 나는 한 그루의 헐벗은 나목이 되어 외로이 서있는 꼴이다. 이런게 인생임을 절감하면서…, 이럴 때마다 나는 버릇처럼 서랍으로 손이 간다. 눈길 닿을 때마다 짜릿한 흥분으로 마음을 흔들어 놓는 곱게 접은 낡은 손수건, 그 손수건에 담긴 추억을 더듬으며 애들과 함께 했던 세월들을 반추해 본다.
하얀 아사천에 아무렇게나 떨군 것같은 붉고 푸른 물감칠이 꽃인양 사이 사이에 작은 잎새들이 몇 개있다. 자그마치 이십여년이나 나이를 먹고 땀에 삭고 낡아서 찢어질 듯 얇아진 것이지만 나는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
누구나 긴 인생을 살다 보면 견디기 어려운 시련의 세월이 있기 마련인가보다. 내게도 한 때 그런 때가 있어 허망한 나날들을 절망하고 살 때였다. 새장에 갇힌 새처럼 집안에만 갇혀 갈등하다가 찾아 낸 돌파구가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였다. 현실 도피하듯 괴로운 시간들을 달래보자는 생각일 뿐 자격이나 되는 사람인지도 깊이 생각 못했다.
아직은 어린 꿈나무들이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상처 속에서 고통을 호소 해 오는 것을 보고 들으며 삶은 곧 고통이고 그 고통 속에서 성숙해져 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프면서 크는 나무가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듯이 그들과 함께 교감하면서 내 자신이 더 큰 위로를 받고 있음도 알게 되었다. 내 고통 때문에 사랑하는 내 자식들 여린가슴 다치게 할까봐 조심도 하고 그들 나름의 세대를 이해하는 좋은 친구가 되어 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나. 10년 긴 세월, 금요일을 내놓은 1000 시간이 넘는 동안에 나는 빛나는 새 세상에 다시 태어난 듯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 드리며 사는 가슴 넓은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엄마 더위에 고생 많으시죠. 여기 이 손수건으로 땀 닦으시고 보람의 나날 되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작은 아이가 등교한 다음에 내 베개 밑에서 편지 한 통과 얌전히 접은 손수건 두 장을 발견했다. 내가 잘못 살지 않았음을 인정받은 것같아 눈물겹게 감동했던 짜릿한 그 때 기분을 어찌 잊으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내 삶이고 희망이고 전부이잖은가.
어려울 때 엄마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친구가 되어주던 내 사랑하는 딸들. 빳빳하게 날이 선 새하얀 컬러의 교복을 입고 등교하던 그 애가 벌써 사십 나이에 와 있다. 이젠 내가 응석을 부리는 입장이 되어서 그들이 날 다독이고 달래 준다.
세파가 할퀴고 지나간 상처를 아물게 해 준 소녀시절의 그 따뜻한 딸의 마음 두고두고 못잊어 영원히 내 가슴속에 묻어 두고 보는 추억의 낡은 손수건. 일찌기 나와 함께 삶의 고통을 나누었던 청소년들도 이젠 으젓한 가장이 되어 훌륭하게 살고 있겠지. 태풍이 지나간 후에 바다는 더더욱 잔잔해 지는 것처럼…….
그 손수건 속엔 그들의 얼굴도 함께 그려져 있다.























































































































































![유트브: [뉴질랜드 사는 김유나] 채널 운영
사진여행, 트래킹여행, 캠퍼밴 동호회 진행
캠퍼밴 렌트대행, 여행상담
캠퍼밴트래블(주) 캠트여행사 대표](/img/columnlist/photo_202101121055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