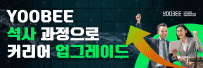| 연재칼럼 | 지난칼럼 |
이삿짐을 싸며
0 개
662
09/12/2025. 18:00
김성국
들의 백합화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
하루에 조금씩만
이삿짐을 꾸렸습니다
그래야 헤어짐이
늦게 올 것 같았습니다
차곡차곡 넣고
구석구석 채웠습니다
그래야 천천히 올 것 같았습니다
짐 드러낸 자리가
휑할 줄 알았는데
다시 무거움으로 메워지는 것은
교우들의 당황스런 눈빛을
마주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악착 같은 열심으로
예배당 쩌렁대는 찬송
울려 나가게 하지 못한
못난 목사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저들이
주님의 따뜻함으로
즐거운 인생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언젠가 마지막 한 번 더 남은
주님께로 가는 이사를 마치면
달력을 보며 삼일절에
교우들이 오늘
그 목사 생일이었지 기억해 준다면
나를 용서해 주는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유트브: [뉴질랜드 사는 김유나] 채널 운영
사진여행, 트래킹여행, 캠퍼밴 동호회 진행
캠퍼밴 렌트대행, 여행상담
캠퍼밴트래블(주) 캠트여행사 대표](/img/columnlist/photo_202101121055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