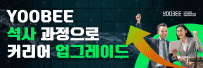| 연재칼럼 | 지난칼럼 |
식물도감을 사들고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
헌책방에서 산
식물도감을 펼쳐 드니
책장마다 색은 바랬어도
꽃들이 어디 헌 책 새 책
가리면서 예쁘던가
늘 보아서 눈에 익어도
이름을 찾아 알려 하지 않았고
예쁜 꽃이라 만지면서도
꽃말을 찾지 않아
낡은 책을 들고 미안해진다
지금껏 우리
서로 이름 모를 꽃처럼 살아왔다
네가 웃음 질 때
그렁그렁 감춘 네 눈물을
알려는 마음 없었고
세상살이에 아파
닳아 해진 네 마음을
헤아려 알지 못했다
헌책방에 묶인 책들처럼
켜켜이 쌓인 우리의 시간
이제부터 하나씩
묵혀진 그 마음 넘겨보며 살자
내 속에
네 이름을 품으면
내 이름도
네 속에서 향기 나느니.








































































































































![유트브: [뉴질랜드 사는 김유나] 채널 운영
사진여행, 트래킹여행, 캠퍼밴 동호회 진행
캠퍼밴 렌트대행, 여행상담
캠퍼밴트래블(주) 캠트여행사 대표](/img/columnlist/photo_202101121055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