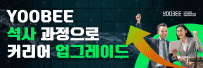| 연재칼럼 | 지난칼럼 |
휴가 - 안락한 일탈과 자유
휴가를 떠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머나먼 곳으로.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포괄적인 의미의 ‘휴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가=집이 아닌 곳으로 여행을 떠나 노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 같다. 그렇게 따지자면 난 한 번도 휴가를 떠나본 적이 없는 셈이 된다. 돌아다니는 것이 치 떨리도록 귀찮았기에. 집 밖은 무서웠고, 또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필요한 건 다 집 안에 있는데, 왜? 새로운 경험, 모험? 그런 거 싫어! 뭐하러? 이렇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요즘엔 어디로든지 훌쩍 떠나고 싶은 충동이 불끈불끈 들곤 한다. 대충 생각 나는 나라와 지명들을 아무렇게나 말해본다. 세르비아. 프랑크푸르트. 마카오. 아비뇽. 나라. 시에라 마드레. 오하이오.
물론 난 겁쟁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곳에는 발도 들이고 싶지 않다. 말이 통하는 곳이라면 대충 범위가 좁혀지니 고르기도 쉬우리라.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를 알아듣는 곳이라면 상관 없다. 대표적으로 가보고 싶은 곳은 런던과 도쿄다. 베이징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홍콩은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한결 같이 쇼핑과 야시장을 추천해줘서 한 번쯤 꼭 가보고 싶긴 하고, 대만은 잔뜩 먹으러 가보고 싶다 (나는 버블티를 매우 좋아한다). 생각은 얼마든지 원대하게 해도 잘못이 아니니까.
몇 달 전부터 유독 가보고 싶었던 곳은,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호주였다.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이면 도착하니 거리도 적절하고, 영어를 쓰는 데다가 꿈에 그리는 황금과 청색 바닷가가 있는 곳! 사진으로나 보는, 백사장 바닥이 하얗게 들여다 보이는 투명한 바다가 너무나도 가보고 싶었다. 뉴질랜드에도 그런 곳이 없는 건 아니지만, 바로 집 근처라는 생각 때문인지 그다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휴가란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일상의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안락한 일탈.
사실 호주를 가본 적이 없는 건 아니다. 다만 너무 어렸을 때였고, 관광 패키지에 섞여 수박 겉핥기 하듯 대충 둘러보고만 온 데다가, 무엇보다 사람들이 너무도 불친절했던 안 좋은 기억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어른이고, 돈이 있고, 영어가 유창하다. 누구든 외지인이란 이유로 만만하게 보거나 함부로 대하려고 하면 큰소리를 쳐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기에 호주를, 이번에는 꼭 혼자서 가보고 싶었다.
여행을 굳이 싫어하는 건 아니다. 어렸을 적엔 돌아다니는 것이 곧잘 즐거웠다. 가족들과 다 함께 바닷가를 찾아 떠나거나 캠프를 갔던 기억은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다. 다만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데에 거쳐야 하는 찻길이 무척 고역스러웠고 (나는 차멀미를 매우 심하게 한다), 밖에서 잘 때면 텐트의 꺼칠꺼칠한 천이 불쾌했다. 무엇보다, 겁이 많았다. 건물 안이 아닌 곳에서 잠을 잔다니, 갑자기 비가 쏟아지거나 텐트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하며 뜬눈으로 밤을 지샌 적도 많았고, 행여나 실내에서 잠을 자게 되더라도 낯선 호텔이나 모텔 침대엔 도저히 길들여지지 않아 마찬가지로 잠을 자지 못했다. 겁이 많은 데다가 잠을 못 자 예민하기까지 했으니 난 결코 여행에 데리고 다니기 쉬운 아이가 아니었다.
막상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휴가지에서 놀 때면 잘만 놀았지만, 그때의 불안한 기억들은 즐거운 추억들과 한데 섞여 그 좋은 기억들을 영 좋게만 남기진 않는다. 그래서일 것이다. 혼자서 여행을 가보고 싶은 것은. 신경 써야 할 타인 없이, 나 홀로 훌쩍.
혼자 가는 것은 겁이 안 나느냐고 묻는다면, 그런 건 아니다. 다만 그 자유로움이 두려움을 압도할 뿐이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는 소박한 꿈이다. 언젠가 꼭 혼자서 떠나리라.








































































































































![유트브: [뉴질랜드 사는 김유나] 채널 운영
사진여행, 트래킹여행, 캠퍼밴 동호회 진행
캠퍼밴 렌트대행, 여행상담
캠퍼밴트래블(주) 캠트여행사 대표](/img/columnlist/photo_202101121055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