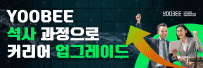| 연재칼럼 | 지난칼럼 |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베이오브 플랜티의 긴 해안을 따라 기스본 쪽으로 향하던 2번 도로는 오포티키를 지나면서
집 몇 채가 전부인 작은 마을들을 스치고 산속으로 접어들기 시작한다.
본격적인 산맥의 초입인 와이오에카 파(Waioeka Pa)를 지나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되는데
강줄기는 차츰 계곡으로 바뀌고 자연림이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광활한 숲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헤쳐도 헤쳐도 능선인 그런 길을 수도 없이 넘어가면서,
오른쪽을 끼고 도는 계곡은 냇가로 좁아지고
냇가가 분산되어 샘으로 수명을 다할 때쯤 이면,
내쳐 오른 곳이 기스본으로 넘어가는 정상이다.
이 산맥의 정상을 중심으로 기스본 쪽으로는 초지가 조성되어 있고 베이오브 플랜티 쪽은 자연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계곡을 오르면서 나타나는 울창한 숲은 대낮인데도 컴컴하고,
얽기 설기 엉켜 검고 칙칙한 나뭇가지엔 초록색 이끼들이 수도 없이 아래로 늘어져 자라고 있다.
휀(fern)이라는 고사리 과의 나무는 여기저기 자라나며 중간 중간 솟아올라 영락없는 쥬라기 공원의 한 장면인데,
쓰러진 나무들에 의해 검은색 돌 틈이 만들어지고 샘이 돋아나는 원천을 만들어 주위를 온통 싸 안은 이끼의 근원을 만들어주고 있다.
계곡물 흘러가는 소리는 쾌청하고,
휀테일(Fantail) 이라는 작은 새가 빠르게 주위를 날며 인간의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해충들을 바쁘게 사냥하고 있다.
격차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거센 물줄기가 물보라를 튀기며 쏟아지는 용소는,
검은 물빛으로 이슥하니 이무기라도 튀어나올 듯한 스산한 분위기다.
뉴질랜드의 돌들이 대게 검은색을 띠고 있어 얼핏 보면 느낌은 그러한데,
누구도 들어가지 않는 자연림에서
한두 방울씩 모인 이슬들이 모여 이루어낸 계곡물은,
그냥 마셔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 깨끗하다.
송어들은 이런 물에서 살맛이 나는데,
녀석들의 삶을 방해하는 낚시꾼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이곳은,
아마도 많은 송어들이 요소요소에 숨어 눈망울을 굴리며 살펴보는 여행자의 이상 (二相)을 관찰하고 있을 것이다.
코를 골며 낮잠을 즐기던 커다란 민물장어가 인기척에 놀라 큰 바위 밑으로 잦아들고,
바탕색을 닮은 손바닥만한 가재는 잽싸게 뒷걸음질을 치며 틈새를 찾아 숨어,
일시에 용소는 오직 물줄기만이 흘러가는 아무도 살지 않는 적막한 장소로 변해 있다.
도시의 많은 그림자들이 지나쳐 엉켜 있는 한낮만큼,
세월 머금은 자연림도 수많은 생물들의 흐름이 존재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눈들이 요소요소에서 지금 기척을 살피고 있을 것인가?
침엽수림은 거대하여 하늘은 빽빽하다.
첩첩이 둘러진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능선엔,
간드러지게 매달린 도로를 육신만 남은 여행자가 조심스럽게 차를 몰아가며 정상을 향하고 있다.
이 고개만 서너 번 넘어본 여행자의 이상(二相)이 계곡에 붙어 숲의 형태를 관찰하고 있는 것이다.
가도가도 첩첩 산중이요,
가파른 오르막길만 존재하는
강원도 정선의 옛날 고갯마루처럼 뭉클함이 서려 있는 이곳에서
그는 들꽃을 찾고 있는 것이다.
숲은 더 깊어지고 해는 더 나은 곳을 찾아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간절한 소망으로 타오르는 들꽃의 화신은 그 숲에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다.
가시덤불을 지날 땐 긴 암흑을 지나는 터널과도 같았는데,
그것은 마치 사랑을 잃은 사람의 가슴에 분노가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 같은 그런 것이었다.
숲은 더 깊어지고, 해는 더 나은 곳을 찾아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다.
그나마 축축한 원시림에 드리운 그림자가 나무위로 올라설 땐
바들거리며 따라올라 더 높은 곳을 향해 직감을 발휘하곤 했는데,
이미 어두워진 숲에서 정상을 향해 올라가기란,
사력을 다해 올라온 경험의 마지막 부분에서 내민 손바닥에 걸린 가시덤불처럼 그런 것이 전부였다.
비수처럼 꽤 뚫어 구멍 난 여행자의 가슴엔 찬바람만 쌩쌩 불며
들꽃의 남은 허상마저 이유 없는 비틀거림으로 멀어져 갔다.
허우적거리는 몸놀림이 마치 지독한 꿈을 꾸는 성자와 같이,
입 속에 담은 온갖 고행이 더 이상 몸 밖으로 배출되기를 거부했다.
미명이 지나 동이 틀 무렵 큰 새가 비명을 지르며 스쳐가는 것을 그는 사막을 헤매다 길 잃은 페르시아 상인처럼 꿈결에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곤 깨어나 온몸에 범벅 된 식은땀을 추려냈을 때,
커다란 불 판에 이글거리며 익어가는 빨간 태양이 수평선 넘어 날짜변경선에서 신속하게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 빛은 통가와 채탐 아일랜드의 상공을 지나,
보다 높은 산이 위치한 산마루에 우뚝 선 여행자의 그림자를 먼저 만들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태양 덕에
밤새 움츠려 들었던 들꽃들은 천지 사방에서 기지개를 펴고 있었다.
휴면된 초지에 핀 노란 야생화 군락이 그 빛을 받고 활짝 펼칠 때,
육신을 실은 자동차는 대낮의 시간을 넘어 미끄러지듯 기스본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다.
고통에 겨워 충혈 되었던 눈빛은 맑아지고,
탐스런 꽃으로 다시 핀 들꽃 한 송이를 눈 하나 깜박 않고 꺽은 여행자는
벌처럼 날아서 나비처럼 자연스럽게 그의 육신을 실은 자동차 속으로 사라져갔다.
세상 사람들이 알려준 재주를 그도 답습하고 싶었던 것이다.
근 시간 반을 넘어오며 꿈을 꾼 목적 없는 여행자의 아름다운 이야기다.
*통가는 세계에서 가장 가깝게 날짜 변경선에 접해있는 나라로 좀 더 떨어져 있는 뉴질랜드와 함께 같은 시간대에 공유되어 있다. 날짜 변경선을 기준으로 떠오른 태양은 낮은 구릉대로 형성되어 있는 통가를 지나 뉴질랜드 기스본에 있는 높은 산맥에 먼저 햇빛이 비추어 진다.








































































































































![유트브: [뉴질랜드 사는 김유나] 채널 운영
사진여행, 트래킹여행, 캠퍼밴 동호회 진행
캠퍼밴 렌트대행, 여행상담
캠퍼밴트래블(주) 캠트여행사 대표](/img/columnlist/photo_202101121055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