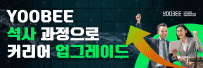생활비 압박은 새 현상이 아니다…

뉴질랜드에서 ‘생활비(cost of living)’라는 말은 최근에 생긴 표현이 아니다. 버터 가격, 유류비 부담, 임금 격차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 표현은 100여 년 전 신문 지면에도 등장했다. RNZ의 장기 기획 시리즈 ‘Pinch Point’에서 케이트 그린(Kate Green) 기자는 과거와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되짚었다.
1912년 뉴질랜드 정부는 물가 상승에 대응해 생활비에 관한 왕립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지난 20년간 생활비가 증가했는지, 최근 10년의 증가폭이 더 컸는지, 그리고 생활수준 향상이 비용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었다.
조사 결과물은 가격·임금·현장 증언을 방대하게 담았다.
주거 실태와 관련해 오클랜드 폰손비 지역의 한 목재상은 “근로자 다수가 임차인이 아니라 자가 소유였고,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경우도 많았다”고 증언했다.
교육비도 언급됐다. 당시 오클랜드 교육감은 “초등 1학년 교재비가 10년 전 연 4실링에서 2실링 3펜스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음주 문화에 대해서는 물가가 낮을 때 1인당 주류 소비가 줄고, 물가가 높을 때 늘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1912년 기준 가구당 평균 주급은 3파운드 4실링 3펜스로, 호주 평균(4파운드 13실링 1펜스)보다 낮았다. 당시 가구는 소득의 약 39%를 식비로 썼다.
반면 최근에는 Stats NZ 자료에 따르면 식비 비중이 약 16%로 낮아졌다.
RNZ가 인터뷰한 경제학자들은 과거의 대표적 어려운 시기로 블랙 버짓(Black Budget), 로저노믹스(Rogernomics), 루서내지아(Ruthanasia)를 꼽았다.
멀둔 정부 시절에는 물가상승률이 18%에 달했는데, 이는 최근(2025년 9월 기준) 3%보다 훨씬 높다.
빅토리아대 로버트 커크비 선임강사는 최근의 압박을 임금 상승이 물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 결과로 설명했다.
“지난 몇 년간 인플레이션으로 가격이 20~30% 오른 반면, 임금 상승은 그에 못 미쳤다. 이 작은 격차가 체감하는 생활비 위기”라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임금 인상은 개인의 성취로, 물가 상승은 외부 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지적했다.
Stats NZ의 니콜라 그라우든은 1900년대부터 물가를 추적해 왔다고 설명했다. 조사 품목은 시대 변화에 따라 레코드에서 카세트, CD, 스트리밍 구독으로 바뀌었고, 유선전화는 휴대전화로 대체됐다.
“사회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그라우든은 글로벌 금융위기, 캔터베리 지진 직후의 공급 차질 등도 대표적 어려움으로 언급했다.
한편 중앙은행은 지난해 11월 공식 기준금리(OCR)를 3년 만의 최저치인 2.25%로 인하했다. Anna Breman 총재가 이끄는 중앙은행의 완화 조치 속에 재무장관은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회복의 신호가 일부에서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