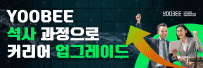뉴질랜드 노동 생태의 이중 구조

뉴질랜드는 인구 약 500만명의 소국이지만, 세계 시장과의 긴밀한 연결로 농산물·관광을 중심으로 한 수출-경제가 작동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는 “대체 산업 부재 & 일자리 창출 한계”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제 구조를 들여다보면, 관광·농업·지역 서비스 등이 핵심축이다. Immigration New Zealand가 정리한 주요 산업군에도 “농업 및 임업, 농수산”이 수출 및 성장의 기둥으로 자리한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진 오늘날, 다음과 같은 제약이 뚜렷하다.
아시아, 호주, 싱가포르 등 비교적 임금·운영비가 낮은 지역에서 동일 산업을 더 저렴하게 운영 가능하다. 따라서 뉴질랜드에 특화된 산업이 없으면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
실제로 전체 생산성 측면에서 뉴질랜드는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을 보인다.
예컨대 최근 10년간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연 0.5%로, OECD 지역 평균(약 0.9%)보다 낮다.
이런 맥락에서 “외딴 소국”이라는 표현은 단지 지리적 의미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다변화 및 글로벌 경쟁에서의 구조적 약점을 의미한다.
뉴질랜드의 농업 기반은 강하며 첨단 기술 도입도 빠른 편이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 농업 생산성은 OECD 동료국 대비 약 68% 수준이다.
또한 자동화·기계화 비중이 높아져 “단위 노동 투입 대비 산출”이 증가했지만, 그로 인해 동일 시간 내 채용 규모 확대 여력은 줄어드는 흐름이 관찰된다.
예컨대 와이카토(Waikato) 지역의 유가공업 중심 농업구조에서도, 2016년 기준 지역 전체 고용 중 농업부문의 비율이 약 7.6%에 불과했다.
이런 구조는 다음과 같은 결과로 이어진다.
청년 대학졸업자 및 전문직 인력이 선호하는 지식집약형 서비스업·첨단 제조업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농업·관광·지역 서비스처럼 “현지 필수형 산업”이긴 하나, 스케일 업 확대·기술 집약화로 인해 일자리 수는 한정적이다.
따라서 뉴질랜드 청년층이 국내에 머물기보다는 해외 진출을 모색하거나, 전문직 진입이 지연되는 경로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뉴질랜드 정부 및 산업계에서도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고 대응 중이다.
농업·식품섬유(food & fibre) 부문에서는 “IT·로보틱스·AI” 등을 접목해 고숙련 직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뉴질랜드 기업의 약 82%가 AI를 도입했고, 이들 기업 중 93%가 효율성 증대 효과를 보고했다.
하지만 OECD 보고서는 “자동화가 일자리를 대량으로 대체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기술 투입이 많아질수록 일자리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중기 전망에 따르면, 2028년까지 연평균 고용 증가율은 약 1.4%로 예상되며, 그중 서비스업·건설업이 상대적으로 강세다.
즉, 뉴질랜드의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농업·관광 외 새로운 산업 축을 키우는 것, 그리고 기존 산업 내 고숙련·기술집약형 일자리로의 전환이 필수다.
뉴질랜드는 지리적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농업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 왔다. 하지만 그 강점이 동시에 구조적 한계—산업 다변화 부족,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제한—로도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금융·기술적 한계를 넘어 농업을 넘어선 신산업 확대, 그리고 농업 내부에서의 고숙련 직무 창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