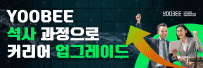600년 전 사라진 ‘키 3.6m 모아새’, 진짜 부활할까?…과학·윤리 논쟁 속 복원 프로젝트 시동

15세기 뉴질랜드 대지에서 자취를 감췄던 ‘전설의 새’ 자이언트 모아(giant moa)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최근 미국 바이오테크 기업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Colossal Biosciences)가 캔터베리 박물관, 나이타후 연구소, 그리고 영화 ‘반지의 제왕’의 피터 잭슨 감독(투자액 약 206억 원)과 손잡고 모아 복원 프로젝트에 착수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뉴질랜드로 쏠리고 있다.
모아는 목을 폈을 때 키가 3.6m, 무게가 230~250kg에 달하는 세계 최대급 조류였다. 튼튼한 다리와 긴 목으로 나뭇잎, 잔가지, 과일을 먹으며 뉴질랜드 전역에 서식했지만, 마오리족의 사냥과 서식지 파괴로 15세기 멸종했다.
콜로설은 모아와 유전적으로 가까운 에뮤, 티나무의 DNA를 편집해 유전적으로 모아에 가까운 새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택했다. 이 새들은 인공 알에서 부화해 외부와 격리된 ‘재야생화 장소’에 방사될 예정이다. 기업 측은 “5~10년 내 실질적 부화가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회의론이 거세다. 모아와 가장 가까운 조류인 티나무와의 진화적 거리는 약 6천만 년. 조류 복원은 포유류보다 훨씬 어려워, 부화 가능한 크기의 알 자체가 현존하지 않는다.
유전자 편집으로 외형이 비슷한 새를 만들 수는 있지만, “진짜 모아의 생명력(mauri)과 생태적 역할을 되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모아는 날개가 완전히 없는 유일한 조류로, 유전자 조작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 사회에서는 복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모아의 뼈와 DNA, 유전체 데이터가 뉴질랜드 내에 남아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다. 일부 이위(부족)는 “멸종 복원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복원된 모아가 실제로 자연에 적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오히려 현존 멸종위기종 보호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모아가 살던 원래 숲과 관목지대는 이미 대부분 사라졌다.
유전적 다양성을 위해 최소 500마리 이상을 번식시켜야 하며, 장기적 보전 예산도 필요하다.
모아 복원 프로젝트는 생명공학의 경이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다. “과거의 거인을 되살릴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생명을 지킬 것인가.”
뉴질랜드의 상징이자 인류 생태계 파괴의 교훈이었던 모아가 과연 21세기 자연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지, 그 앞에 놓인 과학·윤리·생태의 벽은 생각보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