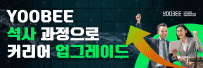뉴질랜드 장례비용, “과도한 부담…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뉴질랜드에서 장례비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장례비는 평균적으로 1만 달러에 달하지만, 지역과 선택에 따라 그 차이가 크고, 최근에는 정부와 시민단체, 장의사협회 모두가 비용 절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뉴질랜드 장의사협회(Funeral Directors Association)의 질리언 보이스 회장은 “장례비는 ‘억지로 하는 구매’이자 ‘슬픔의 구매’”라며,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결국 치러야 하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장례비는 평균 1만 달러 수준이지만, 도시나 지역에 따라 2,650달러에서 8,000달러까지 다양하게 책정된다.
현재 장례와 화장 관련 법률은 1964년과 1973년 제정된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는 15년 전부터 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이스 회장은 “현행 규정 중에는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최근 기술을 활용한 수(水)장 등은 법적으로 아직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빚 없는 죽음(Death Without Debt)’은 전국을 돌며 DIY(직접 장례) 방법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복잡한 서류 절차와 높은 비용이 시민들의 장례 준비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정부 보조금은 최대 2,616달러(Work and Income Funeral Grant)로, 평균 장례비에 크게 못 미친다. ACC(사고보상공사) 장례지원금도 있지만, 지원 대상과 금액에 한계가 있다.
정부 보건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DIY 장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웹사이트를 개선하고, 화장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통합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장의사협회와 시민단체 모두 장례비용의 가격 투명성 확보와 정부 지원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보이스 회장은 “장례비 내역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장례비 내역에는 관, 장지비, 화장비, 서류 처리비, 운구비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된다. 장례지도사의 설명에 따르면, 서류 처리만으로도 수천 달러가 추가되기도 한다.
장례비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저소득층은 문화적·종교적 신념과 달리 화장을 선택하거나, 최소한의 장례만 치르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장례비 부담이 슬픔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