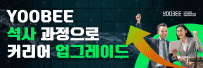'뉴질랜드에서 거의 파산했어요' 높은 생활비로 힘든 이민자들
0 개
8,271
09/11/2019. 14:36
노영례기자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자연과 멋진 풍광, 따뜻하고 친절한 키위들. 이러한 삶을 상상하며 뉴질랜드로 이민을 결정했던 수많은 이민자.
*기사 제공: www.hankiwi.com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상상외로 높은 생활비와 주택가격으로 거의 파산상태에 이르는 등 재정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번 주 뉴질랜드 온라인 언론 매체인 Stuff에서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민자들의 스토리를 소개했다.
기사에서는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이주해 온 이민자들을 취재했는데,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본국보다 상당히 높은 (대략 20~30% 높은) 생활비, 주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데 반해서, 급여는 본국의 70% (50% 이하도 있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민 후 생활의 질(quality of life)은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결국,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을 남겨 두고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온 보람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부분에서 뉴질랜드의 삶은 천국의 삶이라고 말한다. 단지 비용이 많이 드는 천국이라는 것이다.
미국에서 오클랜드에 이민을 와서 사는 Tara는 소수의 전문 직종이 아닌 한 미국에 비해 현저히 급여가 낮기 때문에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고 말한다.
‘Work-life balance, 여유로운 근무환경과 연차휴가 등은 큰 매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여건도 못 된다’고 말한다.
그녀는 오클랜드 주택구매를 위한 융자신청금 20% 보증금만으로도 미국의 웬만한 도시에서는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면서 뉴질랜드의 주택가격이 너무나 비싼 수준이라고 한숨을 쉰다.
또 다른 미국 출신 이민자 Lauren은 높은 주택가격과 생활비를 상쇄하는 부분이 무료 의료서비스와 양질의 공교육이지만, 특히 공공 의료서비스의 경우에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의료설비나 병원시설의 낙후로 인해 크게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많은 뉴질랜드인이 높은 생활비와 주거비용으로 인해 자신들의 삶이 빈곤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키위들 특유의 자기 체념적 태도 ‘다 괜찮을거야 (She’ll be right)도 한몫을 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이민자들이 뉴질랜드의 삶에 적응하고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미네소타에서 와이카토 지역의 Cambridge로 온 가족이 이주해 온 Velma는 겨우 미국에서 얻던 수입의 19%만을 벌고 있다고 한다.
이제 그녀의 가족은 내핍의 생활로 라이프스타일을 바꾸었다고 한다.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생활용품과 음식도 자급자족하는 생활 자세 (Kiwi number-eight-wire mentality)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Velma는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에서 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 그리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인간관계가 황폐해지는 사회에서 벗어난 것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출신인 Anna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녀는 키위 남편을 따라 뉴질랜드로 이주했는데, 이전의 월급의 1/3을 벌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소득세 비율도 이곳이 높아 실수령액은 더 적지만 현재의 생활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자녀들이 평생 자연을 못 느끼고 콘크리트 정글에서 살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 가족은 뉴질랜드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곳으로 이주한 것이 아니다. 일과 휴식의 발란스를 유지하고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를 위해 많은 희생을 치렀고 또 현재도 치르고 있다. 그렇지만 인생은 아무도 모른다. 솔직히 얼마나 이러한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미국인, 영국인들이 이러할진대 언어장벽에 막혀 있는 아시안 이민자들이 체감하는 생활고는 그들보다 훨씬 클 것이다 .
뉴질랜드에서 살고 계신 한국인 이민자 여러분들. 어떻게 잘 헤쳐나가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