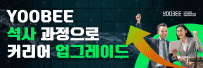[금요열전] 스티븐 애덤스, 뉴질랜드 농구의 거인

뉴질랜드의 거친 바람이 불던 어느 날, 타우랑가의 작은 체육관에서 거대한 소년 하나가 링 밑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스티븐 애덤스(Steven Adams).
훗날 NBA의 센터로 이름을 날릴 이 소년은, 사실 처음부터 농구를 잘했던 건 아니다.
그의 시작은 고독한 연습과 형제들의 응원, 그리고 한없이 긴 뉴질랜드의 오후였다.
애덤스는 뉴질랜드 로토루아 출신으로, 1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의 가족은 그야말로 ‘팀’이었다. 농구를 하든, 밥을 먹든, 설거지를 하든 — 늘 팀워크가 필요했다.
어린 시절 그는 형과 누나들의 신발을 물려 신었고, 집안에서는 키가 너무 커서 항상 문틀에 머리를 부딪쳤다.
그의 아버지 시드 애덤스는 해군 출신으로, 규율에 엄격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일찍 일어나라. 늦잠은 약한 사람의 습관이다.”
그 말은 스티븐의 인생 좌우명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 훈련을 시작하고, 경기 전에는 늘 팀원보다 먼저 체육관에 들어간다.
NBA에서의 스티븐 애덤스는 ‘조용한 리더’로 불린다.
그는 득점왕도, 화려한 덩커도 아니다. 하지만 모든 코치가 그를 원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
그는 팀이 이기는 농구를 한다.
경기 중 누가 실수하면 가장 먼저 다가가 등을 두드려주고, 리바운드 다툼에서는 몸을 던진다.
그의 경기 후 인터뷰는 늘 이렇게 끝난다.
“우리가 이겨서 기쁩니다. 개인 기록은 상관없어요.”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다.
그는 ‘스타보다 팀’이라는 철학을 몸으로 증명하고 있다.
애덤스를 처음 본 사람은 흔히 겁을 먹는다.
키 2m13cm, 덥수룩한 수염, 문신까지. 하지만 그를 조금만 알아가면 ‘세상에서 가장 유쾌한 센터’임을 알게 된다.
한 번은 기자가 물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리바운드를 잘 잡나요?”
그는 웃으며 답했다.
“집에서는 형들이 밥을 먼저 집어가서, 살아남으려면 리바운드를 해야 했어요.”
팀 동료들이 그를 ‘Gentle Giant(부드러운 거인)’이라 부르는 이유다.
무뚝뚝한 겉모습과 달리, 그는 늘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고, 후배를 웃게 만든다.
NBA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시절, 그는 러셀 웨스트브룩과 함께 팀을 이끌었다.
누군가는 그를 ‘웨스트브룩의 보디가드’라고 불렀지만, 애덤스는 오히려 “나는 그가 우리 팀을 더 강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항상 남의 공을 자신보다 먼저 인정하는 태도 — 그것이 그를 리더로 만든 진짜 힘이었다.
경기 외에도 그는 뉴질랜드 농구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젊은 선수들에게 훈련비를 지원하고, 고향의 농구 아카데미를 후원하며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말한다.
스티븐 애덤스의 성공에는 화려한 스킬보다, 꾸준함과 겸손이라는 혁신이 있었다.
그는 늘 말했다. “모두가 슛을 넣는 법을 배우지만, 아무도 스크린을 제대로 서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는 ‘보이지 않는 플레이’를 예술로 만든 선수다.
다른 이들이 주목하지 않는 부분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그의 혁신이었다.
가족은 스티븐에게 힘의 근원이다.
그의 누이 발 아담스는 올림픽에 출전한 포환던지기 선수로, 그는 늘 누이를 ‘진짜 슈퍼스타’라 부른다.
“우린 서로 다른 종목을 하지만, 같은 DNA를 나눈 팀이에요.”
그는 가족의 가치를 팀으로, 팀의 정신을 사회로 확장시켰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농구 이상의 메시지를 전한다 — “함께할 때 더 강하다.”
NBA라는 화려한 세계에서, 스티븐 애덤스는 늘 조용히 자신을 지켜왔다.
스타가 되려는 욕심 대신, 팀이 이기는 농구를 선택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팀에 해줄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농구 이야기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울림을 준다.
성공이란, 자신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다.
스티븐 애덤스 — 그는 그 진리를 거대한 몸과 따뜻한 마음으로 증명한 뉴질랜드의 진짜 거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