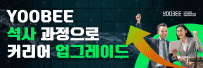호주·뉴질랜드, ‘건강 별점(Health Star Rating)’ 식품 전면 의무화 요구 높아져

식품과 음료에 0.5~5점까지 별점으로 영양 수준을 표시하는 ‘건강 별점(Health Star Rating)’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현재는 자율 참여 방식이라 저점수를 받을 제품은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선택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의 공중보건 단체들은 이 제도를 의무화해 모든 제품에 별점 표시를 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별점 제도는 호주·뉴질랜드 식품 장관이 공동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제조업체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1월 중순까지 모든 식품의 70% 이상에서 자율적으로 별점 표시가 이뤄지도록 목표를 설정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조지 연구소(George Institute for Global Health) 식품 거버넌스 책임자 알렉산드라 존스(Dr Alexandra Jones)는 2019년 검토에서 “제도가 효과적이고 소비자 이해도 높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너무 적은 제품에서만 사용돼 시스템이 왜곡된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별점이 5점 만점인 제품의 60%가 표시를 하지만, 0.5점을 받을 제품 중 표시를 하는 비율은 고작 16%였다. 3점 이하 제품에서 표시 비율은 24%에 불과했다.
존스 박사는 호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경험을 들어, 법률로 요구하면 식품 라벨 전체를 빠르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별점 산정 과정에서 식품업계의 영향력을 배제해 제도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년 말까지 반드시 의무화 여부에 대한 표결이 이뤄져야 하며, 이미 소비자 선택을 개선하고 업계가 소금·설탕 함량을 줄이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타고대 웰링턴 캠퍼스의 크리스티나 클래그혼(Dr Cristina Cleghorn) 박사팀이 올해 3월 발표한 왕립 뉴질랜드 학회지(Journal of the Royal Society of NZ) 논문에 따르면, 현재 제도의 자율성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건강 개선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연구 결과, 모든 제품에 별점 표시가 의무화되면 24,300 건강조정수명(Health-Adjusted Life Years) 증가, 보건 재정 5억6800만 달러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공동연구자 클리오나 니 머큐(Cliona Ni Mhurchu) 교수는 “이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과일·채소 보조금이나 설탕세 같은 강력한 정책과 비교하면 낮다”고 말했다.
호주영양사협회(Margriet Raxworthy 대표)는 의무화와 함께 별점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영양과학이 계속 진화하고 다양한 건강 마케팅 문구가 넘치는 시장 환경에서, 단일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준이 소비자에게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