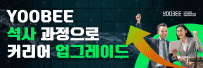“카우보이” 건설업자 우려↑…신축 하자 속출, 또 ‘누수 빌딩’ 사태 우려

뉴질랜드에서 신축 주택 하자가 급증하면서, 업계와 감정평가사들은 “카우보이(부실·무책임) 건설업자”의 득세와 새로운 누수 주택 사태 재발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모기지 브로커들과 주택 구매자들은 리스크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오클랜드 카운슬의 제프 파렌손 수석 건축감정가는 “새 주택에서 바닥 처짐, 용접 부실, 외장재 불량, 뼈대 결함 등 구조적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오클랜드 광역권에서 신규 주택의 최종 검사 불합격률은 3분의 1을 넘어섰고, 주요 하자 유형은 내·외장재(25.6~27%), 기초·배수(14~15%) 등이다.
파렌손은 “사실상 불량을 숨기려 일부러 테이프 등으로 가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건설 면허자(LBP)에 대한 민원도 치솟아 전담 인력을 두고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 소유자 권익단체 Hobanz의 창립자 존 그레이는 “지금 제도의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라며 “하자 주택은 사는 사람 인생 자체를 망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LBP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해, “실상 이름만 올리고 별다른 책임도 안 지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일부 건설업자는 페이퍼컴퍼니(유령법인)를 만들어 책임을 회피하는 일명 ‘피닉스’ 행태도 확산 중이며, 정부는 이 같은 행태를 막기 위해 회사법 및 건축법 개정, 이사 고유번호 도입, 담당 기관 협업 강화 등을 예고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신뢰받는 전문가’의 셀프 인증 제도와 70㎡ 미만 그라니플랫(마당 내 소형 주택) 허가 면제도 비판 대상이다.
빌딩 감정전문가 필 오설리번은 “정치인들이 실제 결함과 복구에 대한 이해 없이 제도를 고안한다”며, “하자를 방치하면 2000년대 초 누수사태처럼 대란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클랜드 마스터빌더 협회 나이절 벤튼 회장은 “시장 대부분은 양질의 시공을 하지만, 붐이 일면 어김없이 카우보이들이 등장한다”고 공인했다.
그는 “의무 보험 등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집값 상승만 초래할 수 있다”며, “소비자는 반드시 시공사, 보험, 계약서 등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건설비도 2025년 2분기 0.6%, 연간 2.7% 올라 장기평균(4.2%)보다는 낮지만 신축 부담으로 작용 중이다.
건축부 장관 크리스 펭크는 “관련 법령 손질, LBP 공개 등록·윤리강령 도입, 책임 규정 재검토 등으로 카우보이 건설업자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일각은 “허술한 처벌 관행, 집행력 부족 등으로 여전히 무책임한 업체들이 활개 친다”며 비관적 시각이 강하다.
뉴질랜드 주택시장에 다시 번지고 있는 ‘부실 시공’의 그늘, 대책 없는 방치가 반복된다면 소비자와 금융권 모두에 치명적 타격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Source: NZ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