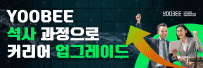인력난 겪는 크라이스트처치 병원, 가족에게 “환자 곁 지켜달라” 요청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병원이 보조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일부 입원 환자의 가족에게 병원에 직접 와서 환자 곁을 지켜줄 수 있는지를 문의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의료계에서는 병원 측의 이러한 요청이 환자 안전과 돌봄 책임의 전가라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익명의 병원 직원이 제공한 내부 정보에 따르면, 6월 22일 크라이스트처치 병원에서는 현장에 배치된 헬스케어 어시스턴트(보조 요양 인력)가 턱없이 부족해 매니저들이 일부 환자 가족에게 자녀나 부모 곁을 지켜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자 감시(patient watch) 업무는 일반적으로 치매, 섬망, 혼란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스스로를 다치게 하거나 치료기구를 제거하지 않도록 옆에서 관찰하고 진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이다. 이는 전문 훈련을 받은 보조 의료진이 담당해야 하는 업무다.
뉴질랜드 간호사협회(NZNO) 소속 대표 알 디치인(Al Dietschin)은 이에 대해 “기존에도 환자가 가족의 존재로 안정을 찾는 경우, 병원 측이 가족의 동의 하에 방문을 요청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6월 요청은 명백한 인력 공백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 보조 인력에게도 환자 감시 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환자와 함께하는 데 지쳐 있는 가족에게까지 그 역할을 맡긴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환자를 돌보다 지친 가족들은 정상적인 환경에서도 버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가족에게 병원이라는 의료 환경에서 전문 업무 일부를 맡기려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디치인 대표는 현재 공공 병원들이 지속적 재정 부족과 긴 채용 동결 상태로 인해 수년째 보조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비정규직 보조 인력들은 근무 신청을 해도 배정되지 않고 있으며, 결원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물론 가족이 자발적으로 환자 곁에 있어줄 수 있다면 의료진 입장에서는 늘 고마운 일이지만, 그것이 ‘병원 측 요청’의 형태로 구조화되는 순간 책임 회피가 된다”고 그는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 뉴질랜드(Health NZ) 캔터베리 지역 간호국장 베키 힉모트(Becky Hickmott)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놨다.
“당시 매우 많은 입원 환자와 갑작스러운 병가로 인해 병원은 인력 배치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모든 환자가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환자 감시가 필요한 환자끼리 함께 배치(cohort)하거나, 가족이 병문안을 오는 경우 이를 고려해 간호 인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족에게 직접적인 돌봄이나 간호를 요청한 것은 아니며, ‘환자 곁에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공공의료 시스템, 특히 병원의 현장 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환자 안전 문제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무엇보다 의료체계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 공백이 일반 시민과 가족에게 직접 전가되는 현실은 정책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이 다시 한 번 부각됐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