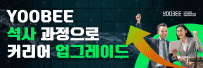정체된 집값이 경기회복을 늦추고 있지만, 경제학자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뉴질랜드 1조 6,000억 달러 규모의 주택 시장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2021년 말 주택 버블 붕괴 이후 가격 상승세가 멈췄다. 최근 REINZ 주택가격지수는 2023년 초 반등 이후 그 기세가 식으며, 2025년 6월까지 1년간 단 0.3% 상승에 그쳤다. 2년 만기 스왑 금리가 170bp 하락했음에도 집값은 제자리걸음이다.
경제 지표도 부진하다. GDP는 2024년 중반 급격한 위축 이후 12~3월엔 반짝 반등했지만, 6월에 또 마이너스 0.3%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집값과 경기의 관계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복잡하다. 경기침체로 집값이 약한 것인지, 집값이 약해서 경기회복이 더딘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경제 칼럼니스트 버나드 히키는 “뉴질랜드 경제는 주택시장에 의존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집값이 회복의 견인차가 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키위뱅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재러드 커는 “낙관적인 경제 성장 예측을 이루려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주택 수요를 자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택장관 크리스 비숍은 “경제 성장이 집값 상승에 의존하는 구조를 반드시 끊겠다”며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경제가 집값 성장에 기반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이번 정부의 핵심 목표”라고 그는 말했다.
주택 부문은 GDP의 15%를 차지하고, 가계 자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
집값이 하락하면 소비 둔화, 건설 침체, 고용 위축으로 경기침체가 심화할 수 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를 땐 그 효과가 하락 때만큼 강하진 않다.
또 소규모 사업체 역시 주택담보 대출을 활용하므로, 집값 약세는 업계 신뢰도와 투자도 위축시킨다.
대다수 경제학자는 집값의 급격한 상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경기 회복이 더 힘들어진다”는 점도 인정한다. 키위뱅크는 올해 집값이 2.5% 상승할 것이라 전망했고, 내년도 전망은 5~7%로 올려 잡았다. 그러나 이미 한 차례 2025년 전망을 하향하며, GDP 성장률도 1.4%에서 0.9%로 낮췄다.
주택가격은 팬데믹 이전 5년간 연평균 8% 오르다, 코로나19 부양책 직후엔 30%까지 급등했다가 이후 급락했다.
준비은행(Reserve Bank)은 집값 상승률이 내년 말 5%에 이른 뒤, 장기적으로는 4.2%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BNZ의 마이크 존스 이코노미스트는 “집값이 오를 때 소비·투자·건설 등 경제 전반에 ‘부의 효과’가 생기지만, 이번 사이클에서는 일자리 불안 등으로 실수요자가 대출을 꺼린다”고 지적했다.
거래량은 낮은 금리로 조금씩 늘고 있지만, 그동안 쌓인 매물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가격 상승이 더딜 수밖에 없다.
그는 “이런 현상이 주택시장 접근성에는 오히려 긍정적”이라며, “과거처럼 집값발 경기회복은 아닐지라도 더 건강한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 컨설팅 기업 인포메트릭스(Infometrics)는 집값 정체가 광범위한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오히려 장기적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앞으로 경기회복은 농업 수출에 힘입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건설·공공부문에 집중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뒤처질 전망이다.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1%로 다소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2022년 정점이었던 1인당 GDP 수준을 2027년까지는 넘기 힘들다"는 것이 인포메트릭스의 진단이다.
주택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느린 회복'이 단기적으로 경제 전반에 부담일 수는 있지만,
거품과 고통이 반복된 과거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비교적 바람직한 변화라는 신중한 전망이 나온다.
Source: Interest.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