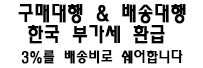| 연재칼럼 | 지난칼럼 |
술 석잔이 있는 풍경화

지루할만큼 질척이던 날씨가 모처럼 화창하다. 비 속에서 외롭게 피어난 자목련의 을씨년스러움도 오늘은 화사하다.
성급하게 봄 냄새가 그리워지는 한나절이다.
“거긴 요즘 날씨 어때요? 춥지않아....”
유난히 손이 시린 친구. 자녀집에 쉬러 왔다가 추위를 못견뎌 서둘러 여름나라로 다시 돌아간 사람이다.
오늘같은 날에... 바야흐로 봄이 오고 있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가 있었다.
그는 손만시려 추운게 아니었다. 공허한 마음이 더 추워 석달 예정 나드리에 두달도 못 버티고 떠나버린 것이다.
어디에 가 있든.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은 여전한가보다.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남편을 저 세상 보내고 그리 의연한척 했지만 그건 진심을 숨긴 과장이었다. 딸들을 따라서, 친구들과 어울려 여행도 많이 다녔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게 두려웠다. 텅 빈 집안이 모랫 벌처럼 허허로워 견딜 수가 없었다.
자식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가끔씩 호소하기도 했다. 그 친구 마음의 봄은 언제나 오려는지....
그분 내외가 여기에 올 때마다 내 입은 호강을 했다. 짧은 여정이지만 빈 텃밭이 싱그러운 채소들로 너울거렸다.
낚시때문에 여기에 오신다던가. 싱싱한 회를 먹을 기회도 참 많았다. 잡아온 물고기를 식탁에 올리기까지 손수 해내는 솜씨가 또한 일품이었다.
재미로 해서 누구를 즐겁게 먹도록 하는게 남편분의 특기였다. 가까이 이웃해 산다는 이유 하나로 시작된 우정이었다.
이젠 단골 손님이 되어 주저없이 식탁앞에 함께 앉곤 했다. 진정 사람냄새 물씬 풍기며 사는 따뜻한 인심을 한가득 가슴에 안고 돌아오곤 했다.
어찌 그리도 간을 잘 마추는지? 바로잡아 담근 간장게장은 줄어드는게 아까웠다. 입 맛 없을 때 별미로 밥을 먹여주기도 했다.
가끔씩 저녁시간이 심심할 때면 아드님을 내게 보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밤길 환한 불빛속에 그 분들 방으로 초대를 받는다. 둥그런 밥상에 그득한 음식들이 내 구미를 자극한다.
“어서 앉으셔, 오늘 안주는‘와이카토’강에서 잡아온 장어 요립니다. 맛이 괜찮던걸요.”
장어 특유의 냄새를 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의 요리는 정말 특별했다. 냄새는 커녕 쫄깃쫄깃하고 감칠맛이 있었다. 새로히 개발한 비법을 써 봤는데 제대로 되었다고 흐뭇해 했다.(역시나.....)
“안주 좋은데 술을 못 한다니 말이 됩니까? 딱 석잔만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친구가 되실텐데 어쩌나...”
은근한 유혹이었다. 그러나 따뜻한 배려였음이기도 했다. 혼자의 외로움을 달래주자는 그 분들의 마음을 진작에 알고 있었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 술석잔 못마실까? 까짓거 만취가 된 들 어떠리... 옥죄고 살았던 긴장이 서서히 풀어졌다. 술잔을 부딪히며 홀짝홀짝 마시다보니 어느새 술 석잔을 거뜬히 마셔버렸다.
우리는 긴 세월 살아온 이야기 허물없이 나누며 더 좋은 친구. 이웃으로 정이 도타와만 갔다.
모처럼 나가는 고국 나드리땐 반드시 그 댁엘 들려야만 했다. 잠깐 만났다 헤어짐은 너무 아쉬어 며칠씩은 묵고 와야만 했다. 질펀한 수다에 늦잠이 들어 게으른 아침을 맞으면 식탁엔 정갈한 반찬과 새로지은 밥솥에서 밥냄새가 구수하게 반겨주었다.
자상하고 너그러운 남편분의 특별한 배려였다. 세상엔 이런 남편도 있구나,라고 살짝 부러운 마음도 드는게 사실이었다. 자녀들 다 잘 키워 출가시키고 부부 오롯이 남아 다정하게 깨소금 냄새 풍기며 진솔한 삶 살아가는 부부였다.
도토리가 지천으로 딩구는 계절에 그 분들이 또 왔다. 바람을 타고온 낙엽속에서 꿈처럼 친구의 목소리를 듣는다. 바쁜 일상으로 바뀐 아들이 픽업을 못해서일까? 낚시를 가지 않았다. 왠지 전과 달리 차분하고 조용했다.
어느날 데크에 널어 말리는 도토리 가루를 보며 놀랬다. 저녁마다 가족들을 데리고 공원을 찾아다니며 도토리를 주워왔다고 했다.(그러면 그렇지)
“몸만 움직이면 돈 주고 사 먹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여기에요”그렇게 말하는 부지런한 분이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어느 밤. 도토리 가루를 한봉지 들고 친구가 내게 왔다. 내일 갑자기 떠나게 되어 인사차 왔다는 것이다.
의아해 하는 내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애들 할아버지가 폐암이래.. 조금 안 좋은가봐”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고 그게 그 분과는 끝이었다. 내게 마지막 선물이 된 묵가루를 냉동실에 참 오랫동안 보관했다. 쉽게 먹을 수가 없었다. 묵을 쑬 때마다 그 분의 얼굴이 떠올랐다.
수 만리 여행을 떠나도 따라다니는 남편의 영상. 지워지지가 않아 힘드는 친구의 마음을 알 것 같다.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죽음이라도 먼저 떠나는 행위는 배신이라고 들었다. 그 위안의 말을 친구가 하루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때 이후 나는 지금까지 술을 입에 대 본적이 없다.























































































































































![유트브: [뉴질랜드 사는 김유나] 채널 운영
사진여행, 트래킹여행, 캠퍼밴 동호회 진행
캠퍼밴 렌트대행, 여행상담
캠퍼밴트래블(주) 캠트여행사 대표](/img/columnlist/photo_202101121055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