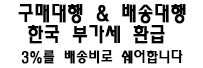| 연재칼럼 | 지난칼럼 |

벽난로 땔감 구하기
0 개
2,286
10/10/2012. 11:33
정경란
길고 하얀 구름의 나라에서 온 편지
뉴질랜드에 처음 여행삼아 온 것이 2010년 1월 셋째주였다. 깨질 것처럼 파아란 하늘과 바다가 우릴 맞아주었다. 뉴질랜드인으로 한국 대학에서 강의하시던 지인의 도움으로 내 소생의 자식 셋과 중딩 조카 둘을 데리고, 여행경비를 아끼려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경유해서 오클랜드 찍고 웰링턴으로 갔다. 세상에. 애 다섯을 데리고 찍고, 찍고, 가다니. 모르면 용감하다고 내가 딱 그 짝이었다.
처음 인사한 뉴질랜드는 아름답고 평화로웠다. 때는 아름다운 여름. 그런데 집안으로 들어가면 오뉴월 한기에, 과연 여름맞나? 싶은 배신감까지 들었다. 가져간 오리털 파카를 실내에서 입고 지냈다. 그런 사전 경험 덕분에 1년 후 다시 웰링턴에 오게 되었을 때는 겨울은 물론 으스스한 여름을 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심적, 물적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오자 마자 주문한 것은 벽난로용 장작이었다. 일단 800 달러를 주고 한 트럭을 샀다. 가을이 오면서 남풍이 불 때마다 벽난로에 불을 지피니 비록 한국식 난방효과까지는 아닐지라도 집안에 훈기가 돌아 지낼만 했다. 하지만 집 전체에 훈기가 돌 정도로 불을 때자면 장작이 많이 소요되었다.
더구나 작년 웰링턴에는 때아닌 폭설 때문에 나름(?)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콧김이 연기처럼 퍼지는 게 보였다. 전기 오일히터를 취침 전 한 시간만 사용했을 뿐인데도 전기요금이 400달러나 나왔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600이니, 700달러를 낸다는 소리를 풍문으로 듣곤 했다.
벽난로에 불을 지피려면 자잘한 불쏘시개가 필요하고, 중간 굵기의 나무, 그리고 굵고 잘 마른 장작이 필요하다. 그런데 집 근처를 돌아다녀 보면, 쓸만한 불쏘시개도 보이고, 제법 굵직한 나무들도 보였다. (잘린 나무들). 그래서 되는 대로 조금씩 주워오기 시작했다. 그러다 아침 산책을 할 때는 조그만 봉지를 들고 나가서 한 봉지씩 담아오곤 했다.
그러다 야트막한 소나무 숲이 둘러싼 동네 공원을 둘러보니, 시에서 간벌한 듯, 잘린 나무들이 곳곳에 쌓여있었다. 내 눈에는 그 나무들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뒷좌석이 제쳐지는 차를 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후, 굵고 긴 ‘목재’를 실어 날랐다. 그리고 일일이 전기톱으로 ‘규격에 맞춰’ 잘라서 (물론 나는 나무를 잡아주는 역할^^) 차곡차곡 쟁여놓았다. 그렇게 여름날을 매일 하루 1시간 정도 나무를 실어 나르고 모았다. 한번은, 동네 공동묘지를 산책삼아 가보니, 굵직한 소나무들이 쌓여있길래 묘지 관리인에게 가져가도 되는지 물었다. 그랬더니 얼마든지 가져가란다. 그 후 한동안 동네 공동묘지를 열심히 드나들며 ‘목재’를 실어 날랐다.

위의 사진은 여름이라도 남풍이 부는 서늘한 날을 위해 따로 쌓아놓은 것이다. 실제 이보다 4배 정도되는 장작들이 그 반대편에 쟁여져 있다. 나무를 주어오면서 나는 난로가 있는 뉴질랜드 인들이 왜 주변에 널린 나무를 주어다 땔감으로 쓰지 않는지 내내 궁금했다. 나름 내가 내린 결론은 이랬다. 그럴만한 시간, 의지가 없고, 주어다 잘라서 땔감으로 쓴다는 ‘아이디어’ 자체를 떠올리지 못한다는 거였다. 아니면 전기톱이 없거나.
공원에 잘려진 나무를 주워다 땔감으로 쓰니, ‘환경미화’에도 일조를 하는 셈이고, 그냥 버려지면 썩기만 할 나무를 연료로 쓰니 난방비 절감도 된다. 그것도 아주 많이. 그 뿐인가. 나뭇짐을 져 나르니 팔뚝도 굵어지고 힘도 세지고 운동도 된다.
차곡 차곡 쟁여진 장작더미를 보노라면 곳간에 쌀 쟁여놓은 것마냥 저절로 배가 부르고 등이 따셔졌다. 우리 가족은 내가 고등학생이 되기 전까지 충청남도의 조그만 읍내에서 살았다. 외할머니는 읍내에서 지척인 시골에서 방 한 칸 초가집을 빌어 사셨다. 어느 겨울날, 할머니를 찾아가보니 뒷산에서 삭정이를 주워다 밥을 하시고 방을 덥히셨다. 새까많게 그을리고 거칠어진 할머니의 손등을 만지는 내 마음에도 생채기가 난 듯 아팠다.
머나먼 남쪽나라로 이사와서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땔감을 쟁여놓으면서 나는 친정엄마를 생각하고, 외할머니의 거친 손등을 떠올린다. 나도 조금씩 나이를 먹어 가는가 보다. 아이들은 엄마가 너무 땔감 모으기에 열을 올린다고, 너무 ‘그리디’ 하다고 불평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당당하게 말한다. “내 새끼들하고 뜨듯하게 살라고 그런다, 왜!”























































































































































![유트브: [뉴질랜드 사는 김유나] 채널 운영
사진여행, 트래킹여행, 캠퍼밴 동호회 진행
캠퍼밴 렌트대행, 여행상담
캠퍼밴트래블(주) 캠트여행사 대표](/img/columnlist/photo_202101121055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