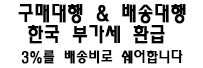| 연재칼럼 | 지난칼럼 |
Pink Ice
0 개
3,716
09/03/2011. 14:34
NZ코리아포스트
재미있는 영어칼럼
“Mummy, I got buried.”(엄마, 나 건물 더미 속에 묻혔어요.) // “I got pinned."(나는 꼼작할 수 없어요.) // “I have not yet been rescued. It’s painful already.”(아직 구조받지 못했어요. 벌써 아파요.) // “The smoke is overwhelming.”(연기가 꽉 차가고 있어요.)
토요반 수업을 위해 학원으로 향하는 길에 아침을 먹기 위해 들른 카페에서 조간 신문에 실린,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엄마에게 구해달라고 애원하던 한 젊은 여성의 텍스트 내용을 읽고 도저히 식사를 할 수가 없었다. 필리핀에 있었다던 그 엄마의 심정이 느껴지고 가슴이 꽉 막혀서, 목으로 음식이 넘어가질 않았다.
뉴질랜더들이 자존심으로 생각하던 정원의 도시(the Garden City), Chirstchurch에서 또 다시 발생한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가족과 친지들을 잃은 사람들만큼이야 하겠는가 마는, TV와 신문을 통해 전달되는 가슴 아픈 뉴스에 며칠 동안 충격에 휩싸였다. 멀리 Auckland에서, 큰 슬픔과 고통에 사로잡힌 Christchurch 시민들과 교민들께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 바를 모른 채, 그저 놀란 가슴을 안고 아프게 바라볼 수 밖에 없을 뿐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금요일, 오늘은 전국적으로 빨강과 검정색의 날(National Red and Black Day)로 정해 복장 중 한가지를 빨간색이나 검정색으로 입고 Christchurch의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캔터버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 모금하는 날이다. 은행 직원들도 빨간색 티셔츠, 남방, 블라우스를 입고 있고 장을 보러 나온 몇 몇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빨간 옷을 입고 다니신다.
이번 Christchurch 지진을 방송으로 접하면서, 뉴질랜더들과 한국사람들의 죽음을 대하는 정서표현의 방법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은 TV와의 인터뷰에서 자기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말하며, 슬픔을 억누른다. 손자를 잃은 할머니도 눈물을 펑펑 쏟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자식을 잃고, 손자를 잃고, 남편을 잃었는데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실신하거나 기절하는 가족들의 아파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다, 그들의 침착한 태도에 내심 놀라서 한 키위 친구에게 물었다. 그 친구는 “They don’t want to make a big scene. (그들은 크게 소동 떨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다. 자신들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 내놓고 분출하고 싶어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그 친구는, 그들도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일 것이라라고 덧붙였다.
처음 뉴질랜드에 왔을 때 교회에 바로 붙어있는 공동묘지를 보고 상당히 이상한 느낌을 받았었다.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 모여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서양 사회에서는 죽음의 의미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죽음은 또 하나의 출발, 완전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새 나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 오랜 기독교 사상 속에서 살아온 서양의 여러 민족들에게는 ‘죽음이 조금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닌 다시 만날 때까지의 잠시 동안의 이별이란 생각이 이렇게 큰 슬픔 속에서도 침착한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뉴질랜드에 사는 10년간 두 분의 키위 할아버지들의 장례식에 참석해 본 경험이 있다. 한 분은 젊어서 네델란드로부터 이민 오셨던 식물학자셨고, 다른 한 분은 전형적인 키위 할아버지로 젊어서는 비행기 조종사로 비행기를 조종하며 세계를 다시시던 분이셨다. 두 분 모두의 장례식은 한국의 장례식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의 장례식 이었다. 슬픔을 머금은 유족들 중 한 명이 나와서 돌아가신 분의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이야기 하면서 때로는 장례식 예배에 참석한 조문객들이 폭소를 터뜨리게도 하고, 평소 고인이 좋아했던 노래인 ‘Turn, Turn, Turn’을 틀어주어 조문객들이 그 가사를 생각하며 위로를 받게도 하는, 고인에 대해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네덜란드 할아버지는 우리와 몇 년을 만나면서 가깝게 지냈어도 자신이 네델란드에서 얼마나 유명한 식물학자였는지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핑크 아이스라는 진분홍의 꽃을 만발하며 폭포처럼 밑으로 떨어지는(cascading) 선인장을 갖다 주기도 하고 우리가 키우다 죽어가던 나무를 집으로 가져가 다음해에 살려서 다시 갖고 오기도 하셨다. 그 분의 장례식 장에서 조카가 그분의 일생에 대해 이야기할 때야 그 분이 유명한 식물학자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에게 장례식 예배는 엄숙하지만 때로는 돌아가신 분들의 아름다웠던 인생을 되돌아 보며 웃기도 하는, 우리의 장례식장 분위기와는 많이 다른 시간이었다.
지금도 우리 집 정원에 핑크아이스가 활짝 필 때는 네델란드 할아버지 생각이 난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토요반 수업을 위해 학원으로 향하는 길에 아침을 먹기 위해 들른 카페에서 조간 신문에 실린,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엄마에게 구해달라고 애원하던 한 젊은 여성의 텍스트 내용을 읽고 도저히 식사를 할 수가 없었다. 필리핀에 있었다던 그 엄마의 심정이 느껴지고 가슴이 꽉 막혀서, 목으로 음식이 넘어가질 않았다.
뉴질랜더들이 자존심으로 생각하던 정원의 도시(the Garden City), Chirstchurch에서 또 다시 발생한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가족과 친지들을 잃은 사람들만큼이야 하겠는가 마는, TV와 신문을 통해 전달되는 가슴 아픈 뉴스에 며칠 동안 충격에 휩싸였다. 멀리 Auckland에서, 큰 슬픔과 고통에 사로잡힌 Christchurch 시민들과 교민들께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 바를 모른 채, 그저 놀란 가슴을 안고 아프게 바라볼 수 밖에 없을 뿐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금요일, 오늘은 전국적으로 빨강과 검정색의 날(National Red and Black Day)로 정해 복장 중 한가지를 빨간색이나 검정색으로 입고 Christchurch의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캔터버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 모금하는 날이다. 은행 직원들도 빨간색 티셔츠, 남방, 블라우스를 입고 있고 장을 보러 나온 몇 몇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빨간 옷을 입고 다니신다.
이번 Christchurch 지진을 방송으로 접하면서, 뉴질랜더들과 한국사람들의 죽음을 대하는 정서표현의 방법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은 TV와의 인터뷰에서 자기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말하며, 슬픔을 억누른다. 손자를 잃은 할머니도 눈물을 펑펑 쏟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자식을 잃고, 손자를 잃고, 남편을 잃었는데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실신하거나 기절하는 가족들의 아파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다, 그들의 침착한 태도에 내심 놀라서 한 키위 친구에게 물었다. 그 친구는 “They don’t want to make a big scene. (그들은 크게 소동 떨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다. 자신들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 내놓고 분출하고 싶어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그 친구는, 그들도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일 것이라라고 덧붙였다.
처음 뉴질랜드에 왔을 때 교회에 바로 붙어있는 공동묘지를 보고 상당히 이상한 느낌을 받았었다.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 모여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서양 사회에서는 죽음의 의미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죽음은 또 하나의 출발, 완전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새 나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 오랜 기독교 사상 속에서 살아온 서양의 여러 민족들에게는 ‘죽음이 조금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닌 다시 만날 때까지의 잠시 동안의 이별이란 생각이 이렇게 큰 슬픔 속에서도 침착한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뉴질랜드에 사는 10년간 두 분의 키위 할아버지들의 장례식에 참석해 본 경험이 있다. 한 분은 젊어서 네델란드로부터 이민 오셨던 식물학자셨고, 다른 한 분은 전형적인 키위 할아버지로 젊어서는 비행기 조종사로 비행기를 조종하며 세계를 다시시던 분이셨다. 두 분 모두의 장례식은 한국의 장례식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의 장례식 이었다. 슬픔을 머금은 유족들 중 한 명이 나와서 돌아가신 분의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이야기 하면서 때로는 장례식 예배에 참석한 조문객들이 폭소를 터뜨리게도 하고, 평소 고인이 좋아했던 노래인 ‘Turn, Turn, Turn’을 틀어주어 조문객들이 그 가사를 생각하며 위로를 받게도 하는, 고인에 대해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네덜란드 할아버지는 우리와 몇 년을 만나면서 가깝게 지냈어도 자신이 네델란드에서 얼마나 유명한 식물학자였는지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핑크 아이스라는 진분홍의 꽃을 만발하며 폭포처럼 밑으로 떨어지는(cascading) 선인장을 갖다 주기도 하고 우리가 키우다 죽어가던 나무를 집으로 가져가 다음해에 살려서 다시 갖고 오기도 하셨다. 그 분의 장례식 장에서 조카가 그분의 일생에 대해 이야기할 때야 그 분이 유명한 식물학자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에게 장례식 예배는 엄숙하지만 때로는 돌아가신 분들의 아름다웠던 인생을 되돌아 보며 웃기도 하는, 우리의 장례식장 분위기와는 많이 다른 시간이었다.
지금도 우리 집 정원에 핑크아이스가 활짝 필 때는 네델란드 할아버지 생각이 난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트브: [뉴질랜드 사는 김유나] 채널 운영
사진여행, 트래킹여행, 캠퍼밴 동호회 진행
캠퍼밴 렌트대행, 여행상담
캠퍼밴트래블(주) 캠트여행사 대표](/img/columnlist/photo_202101121055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