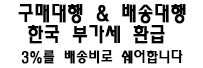| 연재칼럼 | 지난칼럼 |
겨울 - 춥지만 믿지는 않은
한국에는 눈이 왔다고 호들갑스러운 연락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 벌써? 아직 11월인데! 하지만 날씨는, 그리고 기온은 그런 틀에 박힌 시간 관념 따위엔 전혀 상관 않는 모양이다. 벌써 제멋대로 눈까지 내려버렸으니 부정의 여지가 없었다. 한국은 지금 겨울이다. 그것도 무지무지하게 추울.
더운 건 그럭저럭 참을 수 있지만 추운 건 잘 참지 못한다. 이상하게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어 아프게 하기 때문이다.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정말 아프다. 내장까지 푹푹 떠내어지는 듯한 추위는 마치 냉동고 속 아이스크림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한다. 가장 유쾌한 기분은 아니다.
어릴 적엔 겨울이 오면 움직이기 불편한 걸 감수하고서라도 거의 4개월 동안 내복까지 꼭꼭 챙겨 입었고 재킷에 코트까지, 네다섯 겹은 입어야 외출할 수 있었다. 당시에 그다지 한국의 겨울이 심하게 춥지 않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나는 정말 추위에 약한 아이였다 (그러면서도 정작 뛰어놀 땐 잘만 뛰어놀았지만. 살얼음 같은 추위조차도 아이들의 놀고자 하는 열망을 방해하진 못하는 법이다). 감기에 꽤 잘 걸린다는 불운한 체질도 한 몫 했으리라.
일본에는 코타츠(こたつ)라는 물건이 있다고 한다. 따뜻하게 데펴지는 바닥 위에 탁자를 놓고, 그 위로 이불을 덮어씌운 가구의 일종인데 겨울나기엔 그만한 것이 없다는 말을 종종 들었다. 실제로도 사진에서 본 코타츠는 하나 같이 안에 들어가서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찍혀 있어 매우 부러웠다. 얼마나 따뜻할까. 사실 1년의 절반은 전기담요와 함께 생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조금이라도 추우면 잠들지 못하고 견디지 못할 정도로 예민하기 때문에, 열을 한껏 끌어올려놓아야 편히 잘 수 있다. 그런 내게 코타츠는 그야말로 꿈의 - 그리고 그림의 떡인 - 물건이었다.
뉴질랜드의 겨울은 코타츠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있어서 나쁘진 않을 테니.
뉴질랜드의 겨울은 한국의 겨울에 비하면 훨씬 상냥한 편이다. 그리고 한 가지 마음에 드는 점이라면 눈이 오지 않는다는 것일까.
눈은 가뜩이나 추운 날씨에 짜증을 더하는 불순물 이상도 이하도 되지 못한다. 어렸을 때는 좋아했던 것도 같지만 지금은 매우 싫어한다. 아마도 그 계기는 언젠가 매우, 매우 추웠던 겨울날, 장장 4시간 동안 바깥에서 눈을 치워야 했던 경험 때문일 것이다. 부르튼 손은 장갑을 껴도 자꾸만 삽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놓치고, 무릎까지 쌓인 눈은 계속해서 걸음을 방해하는 데다가, 발은 양말까지도 푹 젖어버렸지. 썩 즐거운 경험은 아니었다. 심지어 날씨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으니 더욱!
그러고보니 2013년이었던가, 오클랜드에도 눈이 내렸던 기억이 난다. 아주 짧았고, 한 10분 남짓하게 내리다가 순식간에 녹아 사라졌지만. 그때 나는 시내 거리를 걷고 있었고,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한 눈송이가 너무 작고 약해서 보슬비인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이내 비는‘녹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안이 벙벙해졌지만, 거리를 돌아보았을 때 나와 똑같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이게 착각이 아님을 깨달았다. 세상에, 오클랜드에 눈이라니!
...하지만 대외적으론 눈이 오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감사할 정도로.
이제 겨울은 슬슬 가고 여름 티가 완연하다. 그리웠던 파란 하늘! 쨍하고 더운 온도! 티셔츠, 아이스크림!
지난 1년간 기다렸다.























































































































































![유트브: [뉴질랜드 사는 김유나] 채널 운영
사진여행, 트래킹여행, 캠퍼밴 동호회 진행
캠퍼밴 렌트대행, 여행상담
캠퍼밴트래블(주) 캠트여행사 대표](/img/columnlist/photo_202101121055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