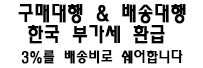| 연재칼럼 | 지난칼럼 |
새
무뎌진 발 뒤끝의 아릿함. 침대 위에서 내려오던 내 발 뒤꿈치도. 여기저기 널부러져 있던 옷가지들도. 방 안 가득 베어있던 담배향들도. 익숙한 손가락의 까칠함에 화들짝 고개를 내저었던 일들도. 생각보다 잊혀지지 않는 것이 너무도 많아. 잘 지내고 있는지.
옥상 위에서, 새가 되고 싶다며, 난간 위에 다리를 곧게 펴고 허리를 굽혀 지면을 보던 너의 모습을, 나는 햇살 속에서 물끄러미 바라보았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너는 새가 아니라, 그저 강렬한 추락의 감정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 때 네가 그 위에서 떨어졌었더라면- 그 격렬한 추락 속에서, 아마도 너는 날개를 한없이 바랬겠지. 네 괴로움의 이유는, 세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었으니까. 너는 날개를 갖지 못했을 것이고, 세상은 자주빛으로 물들었을거야. 너만큼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던 나는, 실망도 기대도 환희도 느끼지 못한 회색 얼굴로 떨어진 너를 내려다보았을 거야.
날지 못하는 새도, 날아가는 새도 무서워했지만, 너는 새가 되고 싶어했어. 산이든 선이든, 그 무엇인가도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실제로는 갖지 못했어. 그저 새가 되었다는 순간의 환상을 품었기에, 나와 손을 잡고 이 곳 저 곳 쏘다닐 수 있었던 것이었겠지.
너는 그리고, 방 속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열려있던 새장의 문을 통해 날아갔어. 새장의 문은 사실 오래 전부터 열려있었던 것이 분명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보았던 게지. 서로간 눈 속의 부산한 날개짓을 관찰하느라, 새장의 문 따윈 신경쓸겨를도 없었던 거야. 그저, 새가 되고 싶었던 거지. 어쩌면 새장 속이라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부산히도 움직였을 지도 몰라. 흔들리는 새장의 달그락 거리는 소리를 우리는 세상이 진동하는 소리로 착각했었으니까.
그렇게 조그만 방에서 너는 나갔고.
아침 해가 박살나는 광경 속에서, 젖은 신문지 냄새가 울컥하고 피어날 것만 같던 그 무채색의 방에서, 더 이상 네 눈은 내 눈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어. 내 방에 고여있던 너의 흔적만이 내 눈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 아마, 거울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내 눈 속은 불 꺼진 터널 같았을 거야. 길고 긴, 끝이 보이지 않는 불온한 공기의 터널같은. 그런 거 말이야.
실은, 넌 몰랐겠지만, 그 터널 속엔 새가 들어있었어. 내가 새가 아니라, 새는 내 눈 속에 있었던 거야. 빛이 번뜩이며 눈 위에 아른거릴 때, 그게 내 날개짓처럼 보인다는 착시의 구조. 아무리 팔을 허우적거리고, 피상적인 움직임에 몸을 맡긴다한들 나는 중력을 거스를 수 없었어. 내가 새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데에 왜 그리 오래걸렸는지. 내 날개는 이미 달궈진 철판 위에 말라붙은 고기처럼 바싹, 재처럼 변해있었지. 너가 내 방을 나간 후에도 그 고깃덩어리를 직시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흘렀었어. 너는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나는 날 바라보았었던 너의 눈이 네 흔적이었으면 했어. 그 흔적이 나를 볼세라, 재빠르게 몸을 움직이고 몸을 숨기고 허세로 위장했어. 제대로 날지도 못하는 주제에 온갖 현란한 컬러감으로 스스로를 감추는 공작새처럼.
시간은 흐르고.
결국 나는- 인간은 새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 물론 우리가 새가 되고 싶어 그렇게 날개를 푸드득거렸던 것이 헛되었다는 말은 아니야. 우리가 방 안에서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새장 문이 열린 지도 모른 채 아직도 방 안에 있을지도 몰라. 우리의 범위를 가늠치 못한 채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바라며 살고 있을지도 모르지.
딱 거기까지, 였던 거야. 우리가 추락할 수 있고, 비행할 수 있었던 범위말이야.
아직도 모르겠어. 그것이 내 삶의 범례였었는지. 그렇다면 그것은 넓었던 것인지 좁았던 것인지.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끊임없이 날개짓을 해야한다는 것. 날개짓을 하는 동안은 그 공간의 크기를 가늠할 필요가 없다는 것. 가끔씩 뒤를 돌아보며- 잘 다듬어진 부리와 발톱으로 새장의 문을 스스로 여닫아야 한다는 것. 방 안에서도 이따금씩 높이 날아오를 때는, 추락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서로의 눈 속에 부서지지 않을 만큼만 상대를 담아두고, 그저 버티는 건 진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날개 속에 포근히 서로를 감싸는 그 시간이 설령 지나치게 길어도- 훗날의 비행에는 크게 상관없다는 것.
이것저것 끄적여보았네. 그리고, 이 글 또한 너가 아닌 너의 흔적에서 따왔음을 고백할게. 이 고백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아주 많이 혼재되어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안심해도 좋아.
다음에 또 보자.























































































































































![유트브: [뉴질랜드 사는 김유나] 채널 운영
사진여행, 트래킹여행, 캠퍼밴 동호회 진행
캠퍼밴 렌트대행, 여행상담
캠퍼밴트래블(주) 캠트여행사 대표](/img/columnlist/photo_202101121055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