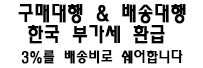| 연재칼럼 | 지난칼럼 |
이빨 - 얻기 위해 잃어야 하는 것
0 개
2,979
10/12/2015. 09:56
한얼
조각 케이크의 나날들
아침밥을 먹다가 이빨이 깨졌다. 정말 어처구니 없었다. 나름 건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만이었던 걸까. 잠깐 아연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딱딱한 걸 먹고 있었냐면, 그것도 아니다. 그저 평범하게 구운 소고기와 야채였을 뿐이다. 야채는 올리브유에 적시다시피 해서 거의 흐물흐물했고, 고기도 살짝 탔을 뿐 부드러웠다. 곁들인 빵도 적당히 거뭇거뭇하게 될 만큼만 구운 토스트였는데. 뭐가 잘못됐던 걸까.
음식에 단단한 것도 없었는데 뭔가 단단한 게 씹혀서 뱉어보니 나온 건 희고 이상한 물체. 이게 뭐지? 했다가, 갑자기 느껴지는 입 안쪽 한켠의 허전함에 말도 안 나와 어어, 어어 하기만 했다. 이렇게 어이 없을 데가!
거울을 보니 과연, 어금니의 1/4이 시원하게 사라져 있었다. 맙소사.
내 이빨은 다행히도 덧니 하나 없고, 대체로 건강한 편이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끄트머리들이 하나같이 톱니처럼 조금씩 삐죽삐죽하다. 젖니가 빠지고 새로 난 영구치들은 전부 그렇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마모되긴 했지만, 그래도 평범하고 매끈한 가장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어렸을 땐 이가 흔들리는 것이 최대의 두려움이었다. 한 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빠질 때까지 계속 흔들어야 하는 그 욱신거림, 빼야 할 때의 고통을 향한 공포가 무겁기 그지없기 때문이었다. 이 정도는 집에서 해결해도 된다는 어른들의 생각 때문인지 나는 젖니를 빼기 위해 한 번도 치과에 간 적이 없었다. 전부 어느 정도 흔든 다음에, 뿌리가 들릴 정도가 되면 아빠나 할아버지가 펜치(!)를 가져와 손수 뽑아주셨다. 그럴 때면 항상 질끈 감은 눈에서 눈물이 찔끔 나왔고, 한동안은 입 안에 생긴 분화구에 휴지를 잔뜩 쑤셔 넣고 지내야 했다.
조금 더 크고 나서는 혼자서도 이빨을 뽑아냈다. 유일한 걱정이라면 피였지만, 그것도 요령을 터득하고 나니 최소한의 출혈로 일을 깔끔하게 끝낼 수 있게 되었다. 열 세 살 때 학교에서 뛰어놀다가, 불현듯 흔들리기 시작한 이빨에 손을 집어넣어 쑤욱 뽑자 화들짝 놀랐던 키위 아이의 얼굴은 지금도 기억난다.
새롭게 이빨들이 난 이후로는 무서운 게 없었다. 무엇이든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었다. 영구치는 젖니와 비교도 할 수 없이 단단하고 튼튼했기에 더없이 믿음직했다.
근데, 그런 영구치가 이런 식으로 나를 배신(?)하다니! 무시무시하기 그지 없다.
혹시 식생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지만 의사에게 물어보니, 그냥 전에 언젠가 금이 갔었던 모양이란 시큰둥한 답변을 들었다. 금이 갈 만큼 딱딱한 걸 먹은 적도 없는데, 어째서일까. 단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먹고 나면 대체로 꼭 이를 닦고, 혹시 싶어서 치실로 이 사이도 열심히 관리하는데. 억울하다.
풀이 죽어 있자니 의사 선생님이 위로해주셨다.
“걱정 마. 그 정도는 쉽게 떼울 수 있으니까.”
“정말인가요?”
크면서 젖니를 모두 뽑아버리고 영구치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처럼 이 황당한 상실에도 뭔가 결과가 따라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 물론 ‘딱딱한 건 조심해서’라던지 ‘먹고 나면 양치는 무조건’ 같은 기본적인 교훈 말고 말이다. 뭔가를 얻기 위해선 뭔가를 잃어야 하는 법이니까. 비록 지금은 순서가 뒤바뀐 것 같긴 해도.
오른쪽 어금니가 깨졌기에 지금은 모든 음식을 왼쪽으로 씹고 있다. 턱이 아프다. 이러다가 혹시 왼쪽 어금니도 쪼개지는 건 아니겠지, 괜한 두려움이 날 만큼.























































































































































![유트브: [뉴질랜드 사는 김유나] 채널 운영
사진여행, 트래킹여행, 캠퍼밴 동호회 진행
캠퍼밴 렌트대행, 여행상담
캠퍼밴트래블(주) 캠트여행사 대표](/img/columnlist/photo_202101121055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