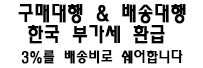| 연재칼럼 | 지난칼럼 |
B 에게
0 개
2,393
12/11/2015. 17:09
박지원
극
안녕하세요. 동갑이지만, 매우 친한 사이이지만, 이번 편지에서는 말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편지를 쓸 때의 제 문체 성향 탓이니, 우리 사이가 멀어졌다거나, 그렇게는 생각하지 말아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얼굴을 못 본지 어느덧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했던 기간만큼 추억 어린 이야기를 조금 꺼내볼까 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이지만, 그 때는 아마 서로를 기억 못할 것입니다. 저는 시인을 꿈꾸던 조용한 아이였고, 당신은 교실의 분위기를 들었다놨다 하던 분위기 메이커였으니까요. 서로, 아, 저런 애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같은 중학교에 입학하여, 3년 째, 우리는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그 때 저는 피아(PIA)라는 한국 락밴드를 비롯해 슬립낫(Slipknot), 콘(Korn) 등에 완전히 빠져있었을 때 였죠. 조금씩 혈기가 끓어오르기 시작할 무렵이었는지, 아무튼 거칠고 짐승과도 같은 샤우팅과 그로울링에 점심 밥조차 잊은 채 학교의 컴퓨터로 그런 음악들을 크게 틀어놓곤 했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더니, 같이 머리를 흔들고 있는 우리를 곧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밥도 거른 채, 정오의 햇살만이 가득한 그 교실에서, 우리는 교복이 다 젖도록 책상과 의자들을 집어던지며 신나게 머리를 흔들어대었었죠.
그리고는 우리는 락페스티벌도 같이 다니고, 희귀음반도 찾아듣고- 음악으로 참 가까워졌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것은 레슬링, 축구였고, 제가 좋아하던 것은 책, 담배 같은 것들이었지만- 단지 음악 하나로 가까워질 정도로, 스스로를 외롭다고 서로가 생각할 나이였을 것입니다. 공유할 수 있는 부분 하나로 서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할 정도의 사이가 되었었던 건, 아마 그 나이였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6살입니다. 이제 사과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시기에 만났던 모든 분들께 사과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당신에게는 더욱 더 깊이 사과하고 싶습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던 당신에게 심야라디오를 가르쳤다는 점. 덕분에 당신은 밤새 음악으로 눅눅하게 젖은 귀를 들고 학교에 가야만 했겠죠. 학교를 그만둬버린 저로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었지만, 밤새도록 같은 주파수의 라디오를 들으며 문자를 주고 받았던- 학생이었던 당신은, 아마 저 때문에 키가 좀 덜 자랐을 겁니다.
학교를 그만둔 채 한가로이 거리를 방황하던 제가, 너네 모의고사라며? 그냥 나와라. 해서 당신은 모의고사를 몇 번이고 땡땡이를 쳤었습니다. 제법 공부도 잘했던 당신이, 학교를 땡땡이치고 저와 함께 노래방에서 10시간을 있었던 일 등을 생각하면, 지금으로선 제가 아주 당당해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물론 당신은 “하고 싶어서 그랬다” 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아마 저라는 존재가 없었더라면, 당신의 인생은 조금 더 모범적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겠지요.
광복절, 개천절.. 하늘이 열리고 법이 제정되고 나라가 광복을 이루고 등등의 때마다 우리는 술을 마셨더랬습니다. 그것도, 밤이 새도록. 머리가 단발에 가까웠던 제가 편의점에 들어가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사오고, 뒷산에 올라가 술을 마셨고, “뚫리는 곳”을 찾아 민증없이 술을 참 잘도 마셔댔습니다. 음악이야기, 학교이야기, 연애이야기.. 무엇이 그리 힘들었었는진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우리 둘은 참 많이도 마셨고, 많이도 떠들어대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지역의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엇박자로 군대에 가게 되면서, 우리는 조금씩 얼굴을 보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친구들이 생겼고, 각자의 관심사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음악으로는, 저는 일본 비주얼락에 빠졌고, 당신은 조금 더 조용한 타입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화학과로, 당신은 치기공과로 들어가면서 관심분야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고, 당신은 조금씩 정신을 차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멀어져갔고, 할 이야기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만날 때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무렵, 제가 군대에 다녀오고 나서, 다시 우리는 음악을 통해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타를 배우고 작곡하는 친구를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우리는 쥐뿔도 모르면서 음반을 내고 싶었고, 남자 셋이 모텔에서 데모작업도 하고, 학교 음악실에서 녹음도 해보았지요.
생각해보면 우리 사이에서 음악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음악 밖에 없을 지도 모릅니다. 성격, 배경 등 모든 것이 참 다르지요. 하지만 실은 콩나물 대가리 수십개가 다섯 개의 선 위에 그려진 그 소리들이,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고, 서로를 터놓을 수 있게 하며, 서로를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냥, 노래는 노래를 부르고 있을 뿐인데. 그 사이사이에 진솔한 이야기와 우리의 추억들이 나지막이 스며들어있습니다. 촌스럽게, 이런 친구를 만나서, 너라는 사람을 만나서 참 좋다, 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소위 헬조선을 떠나- 저는 뉴질랜드에, 당신은 캐나다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가끔씩 문장을 주고 받는 문명의 혜택을 조그만 4인치 화면에서 누리긴 합니다만, 하나 밖에 없는 친구라는 당신이 불현듯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신지요? 저는 그만 쩔쩔매는 중입니다. 어쩌자고 이런 편지같은 것을 써서 이리도 이기적으로 당신을 추억하는지. 그렇지만, 넋두리같은 이 편지가, 언젠가는 당신이 보고- 그래, 그 때 그랬지, 하는 기록의 수기로라도 남는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더 바란다면, 술을 진탕마시고 이 편지를 함께 보며 투닥투닥거릴 날이 오기를 기다려봅니다.























































































































































![유트브: [뉴질랜드 사는 김유나] 채널 운영
사진여행, 트래킹여행, 캠퍼밴 동호회 진행
캠퍼밴 렌트대행, 여행상담
캠퍼밴트래블(주) 캠트여행사 대표](/img/columnlist/photo_202101121055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