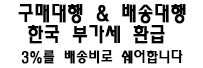| 연재칼럼 | 지난칼럼 |
사과하지 않는 사회
0 개
2,074
24/09/2015. 16:15
정윤성
정윤성의 생활 금융 정보
지난 주 이틀간 뉴질랜드 보험 변호사 협회에서 300여명의 관련 변호사, 사정인, 보험사와 중역들과 보험 브로커가 참여해 향후 뉴질랜드의 보험 관련 법률의 변화 발전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다. 많은 내용중 독자들이 알아 두면 좋은 내용이 있어 적어 본다.
보험에 관한 업무중 가장 힘든 업무를 꼽으라면 당연히 클레임에 관한 보상 처리 업무임은 보험 관련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는 터이다. 이러한 보험보상의 결과가 만족하지 못한 경우 법정까지 가게 되는데 법정까지 가게 되는 케이스들은 예외없이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약관에 따라 보상되어졌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다시 말하면 보험사의 약관 규정들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뉴질랜드 최고법정에 가서야 밝혀진다는 사실이다.
많은 케이스에 대한 강연이 있었는데 지금도 분쟁중인 케이스들은 대부분 책임에 관련한 소송으로 특히 크라이스트 처치의 지진으로 인한 EQC, Insurer, City Council 과 로펌 그리고 피해자간의 책임분쟁들이었다. 예를 들면 3,4년전에 건물의 시장 가격으로 백만불정도 보상받았던 클레임을 올해 번복하여 8백만불로 보험사와 EQC에 재클레임중에 있는 케이스와 전국의 학교 건축물에 사용되었던 외벽 합판 자재의 부적합성으로 인한 NZQA와 뉴질랜드 공급처와 분쟁. 이에따른 법적 비용 보상으로 인한 보험사의 개입 등 흥미로운 보험클레임 사례였다.
보험업과 직접, 간접으로 큰 영향을 미칠 이번호의 제목 ‘사과’에 관한 강연은 뉴질랜드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대목이었다. 영연방 국가 위주로 만들어진 ‘Apology Act’는 캐나다, 미국, 호주와 일본 등의 국가에서 만들어져 적용되고 있고 그 주요내용은 ‘사과-Apology는 위로나 동정의 의미로 사용하고 법적인 책임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러한 ‘Apology’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분쟁의 중재 및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입법,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뉴질랜드는 이 법안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순간 필자는 아! 나라 규모가 작아서 아직은 법률 전문가들이 이런 ‘사과’에 대한 법안까지는 만들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스쳐갔었다. 그러나 다음 화면으로 넘어 가면서 왜 이 법안을 아직 고려 중인지 세가지 이유를 설명을 듣는 나는 역시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를 느끼기도 했다.
못만든게 아니라 안 만들고 있는 이유는
첫째는 ‘사과’에 대한 도덕적 가치를 떨어 뜨린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과’를 전술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 분쟁 보상의 지불을 해야 하는 보험사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뉴질랜드를 사랑하는 필자로서는 작지만 강한 나라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강연이었다. 특히 전문가들의 사과표현은 각 국가별로 법적인 책임과 보상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부상자가 발생한 명백한 과실 교통사고에 까지 ‘사과’를 마다하다간 봉변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적절히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향후 10년내 자연재해를 제치고 가장 큰 액수의 클레임 분야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과 현재의 일반적인 ‘Commercial Insurance’의 보상범위가 아니라는 사실은 관련 산업의 경영자들이 인지하고 준비해야할 내용이었다.
상황에 적합한 보험 디자인과 보험보상 클레임의 정확한 판단에서 나오는 올바른 책임 배정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그리고 보험어드바이저 모두를 안전하고 편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얼마나 많은 정렬과 스트레스 그리고 비용이 들어 가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공부하는 좋은 기회였다. 뉴질랜드를 살아 갈수록 그리고 직업의 관록(?)이 한해가 더 늘수록 느끼는 것은 ‘뉴질랜드 시스템’은 공정하게 잘 디자인되어 있지만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활용가능 하다는 것이다. 사업체 운영에서 비상사태를 위한 준비, 위생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현지 유러피언들의 준비보다 더 강해야 할 이민자들이 오히려 부족해 보이는 건 아쉽다.























































































































































![유트브: [뉴질랜드 사는 김유나] 채널 운영
사진여행, 트래킹여행, 캠퍼밴 동호회 진행
캠퍼밴 렌트대행, 여행상담
캠퍼밴트래블(주) 캠트여행사 대표](/img/columnlist/photo_202101121055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