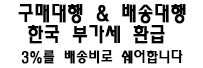| 연재칼럼 | 지난칼럼 |
江(Ⅸ)
0 개
2,243
13/08/2015. 14:05
박지원
극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잠이 든 다음 날 아침.
쓰레기통이 된 두 개의 배럴. 배럴 사이로 흐르는 습기와 강의 물냄새. 아침 산바람에 뒤척거리는 노란 텐트. N이 이를 닦자며 내민 칫솔에 묻어진 치약. 잘못 다듬어진 깃털 같은 칫솔 위에 얹어진 구름 같은 치약. 산 위의 구름. 강 건너편 농장의 풀을 뜯는 양들. 구름 같은 양들. 맑은 강 위에 비쳐진 구름 위에 구름처럼 떠 있는 배.
유영하는 구름. 다양한 색으로 유영하는 구름. 구름 같았던 4박 5일의 여행을 길게 드리운 채 저어지는 노. 4박 뒤의 마지막 1일. 고운 몽돌들 위로 보내는 강 위에서의 마지막 편지. 많은 단어들이 적혀있지만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강의 편지. 돌 아래 끼워진 곱게 접어진 종이. 보물찾기. 누군가 숨겨놓지 않은 보물찾기. 내 안의 보물찾기. 강 위에서.
소중한 것을 버렸을 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경험. 성공과 실패로 나누어질 수 없는 삶. 강 자체가 되는 삶. “어찌되었든 흐르기 마련이니까”라고 말없이 말해주는 삶. 부딪치는 법을 알게 된 상류 위. 빠져나가는 법을 배웠던 중류 위. 정리하는 법을 터득한 하류 위. 흐르는 하늘 같은 모자이크. 추억의 따뜻함.
경쟁하지 않는 삶. 누군가의 배 위든 누가 배 위에 있든 신경을 쓰지 않는 강. 삶. 오로지 인간만이 알 수 없는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드는 삶. 그 삶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 조그만 강을 걷는 걸음. 강 위에서 삶을 조금이나마 터득했던 시간. 실은 강의 일부분에 불과했던 145km의 여정. 내 삶을 길이로 측정한다면 아직 3km조차 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회의감 섞인 설레임.
담담히 종이 위에 기록되는 느린 하류. 다듬고 나열되는 지난 강과 앞으로의 강.
적막한 하류가 지나고 나타나는 사람들. Pipiriki. 그토록 바라던 종착지. 저 편의 선착장에서 우리를 향해 쳐주는 박수들. 아마도 나 뿐만이 아닌 모두를 위해 쳐지는 박수들.
그 때 잠깐의 소용돌이가 일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물에 빠질 뻔했다. 거의 배가 옆으로 반쯤 기울었었는데, 어찌어찌 그 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위험했던 순간이었다. 그 때 우리 바로 뒤에서 다른 배가 침몰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를 아시아인들이었다. N과 나는 그들의 신발을 주워서 던져주었다. 아마도 가이드로 보이는 백인이 그들의 배를 이끌고 근처의 뭍으로 갖다대었다. 우리는 까닭모를 웃음이 났다. 인간인 것이다.
그리고 마치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렸던 망자들처럼, 지친 해방감이 묻은 표정의 사람들. 우리를 반기는 아일랜드 커플도, 5일만에 밟아보는 아스팔트도, 더 이상 오를 일이 없는 배도, 모두 다만 한 표정으로. 기타로 치면 AM7의 코드. 지구도 아닌데 지구에 온 느낌, 집도 아닌데 집에 온 느낌. 침대, 카페, 맥주, 샤워. 속세에서 속세를 잃고 속세를 배운 느낌. 그리고, 배운 것과는 다른 종류의 그리움.
물이 뚝뚝 떨어지는 배. 트럭에 실어지는 배. 운전기사 아저씨의 짧은 물음, 우리의 긴 대답. 꼬불거리는 길 위에서의 잠. 덜컹거리는 꿈. 여전히 배 위인듯, 울렁거리는 풍경.
우리는 돌아왔다. 그리고 가만히 자연을 뒤로 한 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구나 배운다고 해도 배움처럼 잘 되지 않는다. 다만 그 것을 기억한 채, 자연으로 가려고 애쓰게 될 성 싶다. 우리는 어찌되었든, 자연으로 돌아갈 텐데도 불구하고.
江. 강의 소리처럼.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담고 그렇게 우리는 세월 속으로 계속해서 흐를 것이다.























































































































































![유트브: [뉴질랜드 사는 김유나] 채널 운영
사진여행, 트래킹여행, 캠퍼밴 동호회 진행
캠퍼밴 렌트대행, 여행상담
캠퍼밴트래블(주) 캠트여행사 대표](/img/columnlist/photo_202101121055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