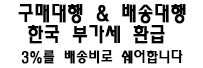| 연재칼럼 | 지난칼럼 |

회색 도시 - 향수(Ⅱ)
0 개
1,067
11/12/2012. 16:04
한얼
조각 케이크의 나날들
그렇게 안간힘을 다해 겨우 오르막길을 올라왔건만, 그 위에 있던 풍경은 나를 허탈케 했다.
언덕 위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잠시 내가 잘못 찾은 건 아닌가 싶었다. 감나무와 석류나무가 있던 멋들어진 이층 주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채- 그 주택 아래 딸려 있던 반지하 쌀가게 집도, 반대편에 있던 까만 대문의 옛날 느낌이 나던 한옥집도 없었다. 대신, 언덕 위 전부를 진회색 빌라들이 끝없이 차지하고 있었다. 명암조차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전부 똑 같은 모노톤으로 칠해져 나를 향해 노란 전등눈을 부라리고 있는 건물들. 사람이 과연 살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불친절하고, 차가워 보이는 회색 콘크리트 숲.
집의 위치를 지나쳐 조금 더 걸어가면 초등학생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가 사는 빌라가 나왔건만 그곳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제 그곳엔 용도를 알 수 없는 커다란 회색 건물이 세워져 있었고, 그 앞의 금속 차단기는 굳건히 닫혀 있었다.
모든 것이, 내 면전에 대놓고 넌 여기에 와봤자 환영 받을 수 없어, 라고 소리지르는 것 같았다.
믿을 수 없지만, 난 어떻게 해서든 그곳에서 예전의 흔적이라도 찾아보려 돌아다니다가 정말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어렸을 때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손바닥처럼 훤히 꿰뚫고 있던 곳이었는데. 작은 실골목, 지름길 하나하나까지도. 하지만 골목길들은 밀집된 빌라들이 막아버렸고, 지름길들은 이제 그 주변의 건물들이 모조리 교체되거나 철거되어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아직 이른 저녁이었건만 하다못해 지나가는 사람 한 명, 도둑 고양이 한 마리도 없이 무덤가처럼 싸늘했다.
그리고 나는, 그 상실감을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어버렸다.
도무지 울음이 멈추지 않았고, 멈출 생각도 들지 않았다. 친숙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달라져 버렸다는 두려움, 추억의 장소를 잃어버렸다는 충격 때문이었으리라. 애당초 사람의 감정을 말로 일일이 표현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마는, 그때 심장이 뱃속 깊은 곳까지 뚝 떨어지며 체내에 블랙홀이 생겨난 것 같은 그 기분은 단순한 상실감 그 이상이었다.
가을마다 보리수 열매와 감을 따고, 봄이면 단 맛 나는 석류와 신 버찌가 열리던 나무들이 있던 정원. 강아지와 상추를 키웠던 작은 마당. 이름도 몰랐던 넝쿨 식물이 자유롭게 뻗어있던 돌벽과 어둡고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던 목재 내부도. 내 어린 시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랜드마크가 사라진 것은 분명 중대한 사건이었으니까.
다 큰 여자가 울면서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은 분명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겠지만,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나는 소중한 것을 잃었고, 그것을 애도할 시간이 필요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옳겠지. 그날, 나는 감나무와 보리수 나무가 있었던 이층집에 살던 아홉 살 어린아이가 되어 울고 싶은 만큼 걸으면서 실컷 울었다. 학교를 지나치고, 횡단보도와 육교를 넘어 다시 돌아가는 동안 내내.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작은 집에 와 있었다.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나고 주변을 인식도 못했지만, 일단 정신이 들어보니 그 현관에 서 있었다.
눈이 벌개진 채 갑작스럽게 나타난 나를 보고 작은 엄마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나오셨다.
“한얼아! 무슨 일이야? 왜 울었어?”
잠시 머릿속으로 생각을 고르느라 대답을 곧장 할 수 없었다. 어떻게 설명하랴. 이 모든 감정의 혼란을. 비이성적일 정도로 뇌를 점령해버린 공황을.
나는 다만, 씩 웃어버리며 답했다. 비록 약간 멋쩍긴 했어도.
“그냥, 길을 잃어버려서 조금 놀랐어요.”
언덕 위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잠시 내가 잘못 찾은 건 아닌가 싶었다. 감나무와 석류나무가 있던 멋들어진 이층 주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채- 그 주택 아래 딸려 있던 반지하 쌀가게 집도, 반대편에 있던 까만 대문의 옛날 느낌이 나던 한옥집도 없었다. 대신, 언덕 위 전부를 진회색 빌라들이 끝없이 차지하고 있었다. 명암조차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전부 똑 같은 모노톤으로 칠해져 나를 향해 노란 전등눈을 부라리고 있는 건물들. 사람이 과연 살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불친절하고, 차가워 보이는 회색 콘크리트 숲.
집의 위치를 지나쳐 조금 더 걸어가면 초등학생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가 사는 빌라가 나왔건만 그곳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제 그곳엔 용도를 알 수 없는 커다란 회색 건물이 세워져 있었고, 그 앞의 금속 차단기는 굳건히 닫혀 있었다.
모든 것이, 내 면전에 대놓고 넌 여기에 와봤자 환영 받을 수 없어, 라고 소리지르는 것 같았다.
믿을 수 없지만, 난 어떻게 해서든 그곳에서 예전의 흔적이라도 찾아보려 돌아다니다가 정말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어렸을 때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손바닥처럼 훤히 꿰뚫고 있던 곳이었는데. 작은 실골목, 지름길 하나하나까지도. 하지만 골목길들은 밀집된 빌라들이 막아버렸고, 지름길들은 이제 그 주변의 건물들이 모조리 교체되거나 철거되어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아직 이른 저녁이었건만 하다못해 지나가는 사람 한 명, 도둑 고양이 한 마리도 없이 무덤가처럼 싸늘했다.
그리고 나는, 그 상실감을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어버렸다.
도무지 울음이 멈추지 않았고, 멈출 생각도 들지 않았다. 친숙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달라져 버렸다는 두려움, 추억의 장소를 잃어버렸다는 충격 때문이었으리라. 애당초 사람의 감정을 말로 일일이 표현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마는, 그때 심장이 뱃속 깊은 곳까지 뚝 떨어지며 체내에 블랙홀이 생겨난 것 같은 그 기분은 단순한 상실감 그 이상이었다.
가을마다 보리수 열매와 감을 따고, 봄이면 단 맛 나는 석류와 신 버찌가 열리던 나무들이 있던 정원. 강아지와 상추를 키웠던 작은 마당. 이름도 몰랐던 넝쿨 식물이 자유롭게 뻗어있던 돌벽과 어둡고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던 목재 내부도. 내 어린 시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랜드마크가 사라진 것은 분명 중대한 사건이었으니까.
다 큰 여자가 울면서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은 분명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겠지만,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나는 소중한 것을 잃었고, 그것을 애도할 시간이 필요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옳겠지. 그날, 나는 감나무와 보리수 나무가 있었던 이층집에 살던 아홉 살 어린아이가 되어 울고 싶은 만큼 걸으면서 실컷 울었다. 학교를 지나치고, 횡단보도와 육교를 넘어 다시 돌아가는 동안 내내.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작은 집에 와 있었다.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나고 주변을 인식도 못했지만, 일단 정신이 들어보니 그 현관에 서 있었다.
눈이 벌개진 채 갑작스럽게 나타난 나를 보고 작은 엄마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나오셨다.
“한얼아! 무슨 일이야? 왜 울었어?”
잠시 머릿속으로 생각을 고르느라 대답을 곧장 할 수 없었다. 어떻게 설명하랴. 이 모든 감정의 혼란을. 비이성적일 정도로 뇌를 점령해버린 공황을.
나는 다만, 씩 웃어버리며 답했다. 비록 약간 멋쩍긴 했어도.
“그냥, 길을 잃어버려서 조금 놀랐어요.”























































































































































![유트브: [뉴질랜드 사는 김유나] 채널 운영
사진여행, 트래킹여행, 캠퍼밴 동호회 진행
캠퍼밴 렌트대행, 여행상담
캠퍼밴트래블(주) 캠트여행사 대표](/img/columnlist/photo_202101121055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