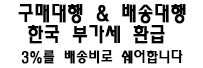| 연재칼럼 | 지난칼럼 |
개미와 덩치
0 개
3,734
25/08/2009. 16:43
코리아포스트
재미있는 영어칼럼
6살 아이가 열심히 짓밟고 있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점 재미가 붙고, 이제는 발로 짓이기는 일과 자신이 동일시되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인지도 모르고 짓밟는다. 개미들을! 평생을, 5mm밖에 안 되는 자신의 몸통보다 세 배나 더 커 보이는 먹이를 열심히 성실히 지고 나르기만 했던 일개미들도, 그 세계에서는 그래도 장엄한 표정을 짓던 수 개미들도, 품격적 혈통을 지켜 오다 아비규환의 피난 행렬 개미 군상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여왕 개미도 아이의 발길질에 무참히 죽어간다.
“엄마, 산 비탈에 저게 뭐야?”
“판자집이란다. – 아직도 판자집이 있네.”
“집을 판자로 지었어, 강아지 집처럼, 누가 살어?”
“---.”
“누가 살어?”
“사람이 산단다.”
“저기서, 사람이, 살어,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그래.”
“아, 우리 식구 취미가 골프인 것처럼, 저 사람들 취미가 등산인가 보구나. 저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 이야?”
“그만봐라. 신경 쓸 것 없다. – 왜 아직도 저대로 놔두는거야, 지저분하게. 장관님은 뭐하셔, 빨리 뉴타운 개발 추진 안하고. – 김기사, 다음부터는 이 길로 오지 말어, 애들 교육에 나쁘겠어.”
6살 계집아이는 아직도 발길질에 열심이다. 파출부 엄마가 일하는 성곽 같은 집 앞 콘크리트 도로가 갈라져 드러나 보이는 땅 속 개미들을 아이는 너덜해진 조그만 운동화 앞굼치로 누르고 있다. 음식 부스러기라도 가지고 큰 대문에서 나올 엄마를 기다리며 개미와 '놀고' 있는 계집아이를 학교에서 돌아오던 골프가 취미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발로 툭 찬다. “야, 저리 가. 지저분하게!” 땅에 쓰러진 계집아이의 무릎에선 성곽 안으로 보이는 자목련 빛처럼 고운 피가 흐르지만, 벤츠 자동차에서 내리는 주인집 아주머니의 쌍꺼풀 수술로 푹 파여 부릅 뜬 것처럼 보이는 눈길에 계집아이는 울음소리도 말라 붙어 버린다.
인간은 작아 보이는 존재들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하고 냉혹해질 수 있을까?
All we really need to know about how to live and what to do, we learned in kindergarten.(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정말로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유치원에서 배웠다.) The things we learned in kindergarten include “share everything,” “play fair,” and “say you're sorry when you hurt somebody.”(유치원에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는 “모든 것을 나누어라, 정당하게 겨루어라, 누군가를 아프게 했을 때는 미안 하다고 말해라.” 등이 있다.) Sadly, however, we don't apply these rules to our family life, work or government when we become adults.(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어른이 되었을 때 이러한 규칙들을 가정 생활에서나 직장에서나 정부에서 적용하지 않고 있다.)
지금 한국에선 ‘동네 구멍가게’의 수입마저도 탐내는 ‘대기업’들의 이른바 기업형 슈퍼마켓이 늘어나고 있 다고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논리대로 행한다고 하지만, 참 좋은 유치원을 나왔음에 틀림없을 것 같은 CEO들이 그렇게 밖에 행동할 수 밖에 없는지 유치원을 못 나온, 나는 알 수가 없다. 당연히 ‘we are sorry’라고는 하지도 않을 것이고, ‘share everything’은 못해도 ‘play fair’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참, 덩치 값도 못 한다.
미국 26대 대통령이었던 Theodore Roosebelt는 190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만큼 뛰어난 정치가였지만, 다른 여러 면에서도 특출 났다. 그는 너무도 지독한 근시였기 때문에 안경 없이는 3m 앞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들도 못 알아 볼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명사수였다. 사냥을 너무 좋아해서 아프리카까지 가서 돌진해 오는 사자를 쏘아 쓰러뜨릴 정도로 사격술이 뛰어났던 큰 사냥꾼이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새를 쏘지는 않았다고 한다.
왜? 정당한 싸움(play fair)이 아니었으니까!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마, 산 비탈에 저게 뭐야?”
“판자집이란다. – 아직도 판자집이 있네.”
“집을 판자로 지었어, 강아지 집처럼, 누가 살어?”
“---.”
“누가 살어?”
“사람이 산단다.”
“저기서, 사람이, 살어,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그래.”
“아, 우리 식구 취미가 골프인 것처럼, 저 사람들 취미가 등산인가 보구나. 저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 이야?”
“그만봐라. 신경 쓸 것 없다. – 왜 아직도 저대로 놔두는거야, 지저분하게. 장관님은 뭐하셔, 빨리 뉴타운 개발 추진 안하고. – 김기사, 다음부터는 이 길로 오지 말어, 애들 교육에 나쁘겠어.”
6살 계집아이는 아직도 발길질에 열심이다. 파출부 엄마가 일하는 성곽 같은 집 앞 콘크리트 도로가 갈라져 드러나 보이는 땅 속 개미들을 아이는 너덜해진 조그만 운동화 앞굼치로 누르고 있다. 음식 부스러기라도 가지고 큰 대문에서 나올 엄마를 기다리며 개미와 '놀고' 있는 계집아이를 학교에서 돌아오던 골프가 취미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발로 툭 찬다. “야, 저리 가. 지저분하게!” 땅에 쓰러진 계집아이의 무릎에선 성곽 안으로 보이는 자목련 빛처럼 고운 피가 흐르지만, 벤츠 자동차에서 내리는 주인집 아주머니의 쌍꺼풀 수술로 푹 파여 부릅 뜬 것처럼 보이는 눈길에 계집아이는 울음소리도 말라 붙어 버린다.
인간은 작아 보이는 존재들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하고 냉혹해질 수 있을까?
All we really need to know about how to live and what to do, we learned in kindergarten.(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정말로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유치원에서 배웠다.) The things we learned in kindergarten include “share everything,” “play fair,” and “say you're sorry when you hurt somebody.”(유치원에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는 “모든 것을 나누어라, 정당하게 겨루어라, 누군가를 아프게 했을 때는 미안 하다고 말해라.” 등이 있다.) Sadly, however, we don't apply these rules to our family life, work or government when we become adults.(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어른이 되었을 때 이러한 규칙들을 가정 생활에서나 직장에서나 정부에서 적용하지 않고 있다.)
지금 한국에선 ‘동네 구멍가게’의 수입마저도 탐내는 ‘대기업’들의 이른바 기업형 슈퍼마켓이 늘어나고 있 다고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논리대로 행한다고 하지만, 참 좋은 유치원을 나왔음에 틀림없을 것 같은 CEO들이 그렇게 밖에 행동할 수 밖에 없는지 유치원을 못 나온, 나는 알 수가 없다. 당연히 ‘we are sorry’라고는 하지도 않을 것이고, ‘share everything’은 못해도 ‘play fair’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참, 덩치 값도 못 한다.
미국 26대 대통령이었던 Theodore Roosebelt는 190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만큼 뛰어난 정치가였지만, 다른 여러 면에서도 특출 났다. 그는 너무도 지독한 근시였기 때문에 안경 없이는 3m 앞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들도 못 알아 볼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명사수였다. 사냥을 너무 좋아해서 아프리카까지 가서 돌진해 오는 사자를 쏘아 쓰러뜨릴 정도로 사격술이 뛰어났던 큰 사냥꾼이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새를 쏘지는 않았다고 한다.
왜? 정당한 싸움(play fair)이 아니었으니까!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트브: [뉴질랜드 사는 김유나] 채널 운영
사진여행, 트래킹여행, 캠퍼밴 동호회 진행
캠퍼밴 렌트대행, 여행상담
캠퍼밴트래블(주) 캠트여행사 대표](/img/columnlist/photo_20210112105536.jpg)